

산속에서, 움푹 들어간 구덩이에 침낭을 깔면서 그는 오늘이 며칠째인가, 떠올려 보았다. 나흘째였다. 나흘. 그 시간 동안 그는 온전히 산속에서 노숙을 한 것이었다. 다행히 그동안 비는 오지 않았다.
그는 침낭 속에 들어가 눈을 감은 채, 노숙을 시작한 첫날을 생각해보았다. 퇴근하기 전부터 아내로부터 쉴 새 없이 날아오던 문자들, 책상 서랍 아래에서 발견된 카드명세서, 거기에 찍혀 있는 술값의 정확한 사실 여부, 질문들, 질문들…. 그리고 이따 집에서 보자는 짤막한 문장 하나. 계체를 목전에 둔 선수처럼 그는 퇴근하기 전까지,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 내내, 불안한 눈빛으로 아내가 보낸 문자들을 반복해서 읽고 또 읽었다. 아파트 단지 정문 앞에 도착하고 나서도 십오 분 넘게 같은 자리만 맴돌던 그는, 마침 마트에 다녀오던 아내와 막내아들을 정면으로 맞부닥뜨리고 말았다. 중학교 일학년, 초등학교 삼학년, 두 사내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아내는, 그보다 어깨도 넓었고, 손목도 굵었다.
아내는 그에게 손에 들고 있던 커다란 비닐봉지 하나를 건네주면서 눈을 부라렸다. 라면과 두부, 콩나물이 잔뜩 들어 있는 비닐봉지였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는적는적 아내의 뒤를 따랐다. 그런 그에게 막내아들이 잠깐 고개를 돌려 말했다. 아빠, 오늘 죽었대.
그러니까 그가 비닐봉지를 들고 무작정 아파트 단지 후문 쪽으로 뛰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때였다. 뚜렷한 목적이나 의미는 없었다. 순간을 피하고 싶은 마음도 아니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본능적이고 충동적인 달리기였다. 그런 그를 보면서 막내아들은 ‘아빠, 그러면 더 큰일 날 텐데!’라고 소리쳤고, 그의 아내는 ‘저, 저…’ 하면서 인상을 찌푸렸다.
아파트 단지 후문 쪽은 그리 높지 않은 야산의 등산로와 이어져 있었다. 그는 등산로를 따라 한참을 달리다가 숲 속으로 방향을 틀었다. 사위는 이미 어두컴컴하게 변해 있었다. 그는 잡풀이 무성한, 어느 버려진 무덤 옆에 앉았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고,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 수 있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허기가 밀려 들어왔다. 그는 비닐봉지에서 라면을 꺼내 우적우적 씹어 먹었다. 그러고도 허기가 가시지 않아, 내처 두부까지 먹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은 여기서 자기로 결심했다. 여기서 하룻밤을 보내고 내려가면, 그러면 좀 불쌍해 보이지 않을까? 그는 두부를 다 먹은 뒤, 군 시절 배운 것처럼 얕은 구덩이를 찾기 시작했고, 거기에 잡풀과 커다란 잎사귀를 깔기 시작했다. 그것이 그의 야산에서의 첫날밤이었다.
침낭 속에서 그는 가만히 별을 바라보았다. 별은 좋겠다, 카드 값 걱정 안 해서…. 그는 괜스레 그렇게 혼잣말을 했다. 달빛은 은은했고, 주위는 놀랄 만큼 조용했다. 휴대전화 배터리는 다 떨어진 지 오래였다. 그는 아내가 보낸 마지막 문자를 떠올렸다. 그만 돌아와, 다음 달부터 잘하면 되지. 내일 막내 체험학습 가야 한단 말이야. 그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이번엔 달을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또 혼잣말을 했다. 달은 좋겠다, 다음 달에도 그냥 달이어서…. 그는 그러고선 침낭 속에서 허리를 잔뜩 웅크렸다. 서서히, 잠이 올 것 같았다.
이기호 소설가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이기호의 짧은소설]5월 8일생](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5/05/13/71209123.2.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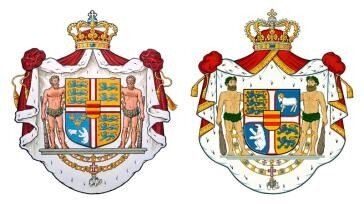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