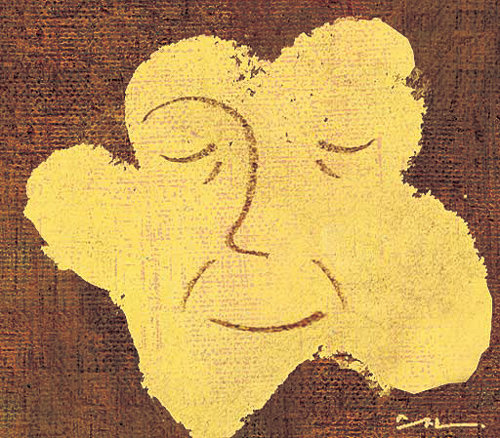
상치꽃 아욱꽃 ―박용래(1925∼1980)
상치꽃은
상치 대궁만큼 웃네.
아욱꽃은
아욱 대궁만큼
잔 비우고
배꼽
내놓고 웃네.
이끼 낀
돌담
아 이즈러진 달이
실낱 같다는
잊었네.
아욱 잎은 국 끓여 먹고, 상추 잎은 생것을 쌈으로 먹고. 먹을거리로만 그 잎을 보아 온 사람들은 상추와 아욱도 꽃이 핀다는 당연한 사실을 잊기 쉬우리. 때는 한여름, 해는 저의 긴 날을 늘어지는 걸음으로 지나고 있었을 테다. 마루에 앉아 ‘잔 한잔 비우고/잔 비우’며 건너다보는 마당 텃밭에 ‘상치꽃은/상치 대궁만큼 웃네.//아욱꽃은 아욱 대궁만큼’ 웃네. 남겨진 대궁마다 함초롬히 상추꽃 아욱꽃, 화자가 보기 좋은 높이로 피었으리.
화자는 ‘배꼽/내놓고 웃네’. 자기 집에 있는데 무더운 날에 옷을 대충 걸친들 어떠랴. 화자는 러닝셔츠를 가슴께로 훌떡 걷어 올리고 있을 테다. 어쩌면 웃통을 벗고 있을지도. 상추와 아욱도 ‘배꼽/내놓고 웃네’. 꽃은 식물의 배꼽, 씨앗의 근원이라네. 꽃이 없으면 세대에서 세대로 어찌 이어지리. 그러니 상추와 아욱의 꽃은 임부의 자랑인 불룩한 배인 것, 그 배꼽인 것. 꽃 핀 텃밭을 정답게 완상하며 술을 마시는 나른한 흔쾌함이 ‘이끼 낀/돌담’부터 편치 않은 정조로 바뀐다. 하루 이틀 전까지 이어졌을 장마에 이끼 무성해진 돌담은 볕이 안 들어 축축하리라. 그 위로 저물어가는 하늘 동편에 실낱같은 달이 뜨고, 문득 ‘이즈러진 달이/실낱같다는’ 시구가 떠오르는데 그 ‘시인의 이름’ 떠오르지 않고. 어떤 부분은 더 선명하고 어떤 부분은 더 가물가물한 명정 상태에서 왠지 화자의 기분이, 술 잘 마셔놓고, 자욱이 가라앉는 듯.
박용래의 시들은 최소한의 언어로 최대한의 세계를 담는 게 미덕인 시의 전범으로 삼을 만하다. 독자는 그 간결한 시들이 우아하게 이끄는 정답고 소박한 세계에서 가슴 아릿한 원초적 향수에 젖어든다.
황인숙 시인
황인숙의 행복한 시 읽기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동아광장
구독
-

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
구독
-

고양이 눈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황인숙의 행복한 시읽기]밥 먹는 풍경](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5/07/31/72800430.1.jpg)


![“1초 스캔으로 잔반 줄이고 건강 지키는 마법”[허진석의 톡톡 스타트업]](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486662.1.thumb.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