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조금 불편해져야 한다/이상헌 지음/272쪽·1만5000원·생각의힘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고객은 ‘왕’ 대접을 받는다. 직원들이 작은 실수라도 하면 “점장 나오라”며 거세게 항의하기 일쑤다. 서비스 노동자는 고객의 하인들이다.
하지만 책은 이런 현실과는 다른 제목을 갖고 있다. 저자가 현재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사무차장 정책특보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고개가 끄덕거려진다. 그는 2011년 국제노동기구 100차 총회에서 채택된 가사노동협약의 초안을 작성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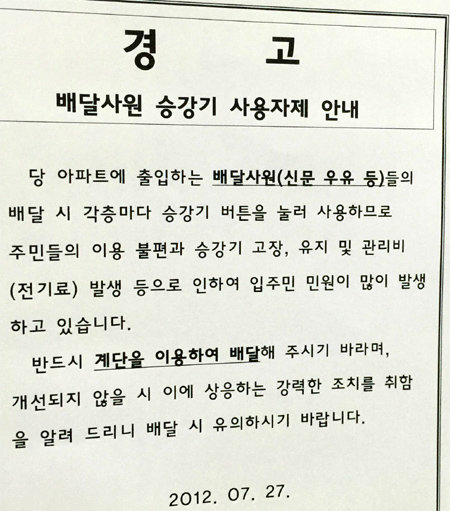
사실 ‘왕’(고객)들도 직장에 가면 노동자이고, ‘하인’도 일터를 벗어나면 소비자다. 그러기에 과잉 친절을 강요하는 기업을 거부하고 ‘우리가 조금 불편해지자’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기자는 몇 년 전 프랑스 남부 해안의 한 도시로 출장을 갔다. 점포에서 물건을 사고 지불을 하려는데 계산원이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이나 수다를 떨었다. 남자친구 험담이라도 하는 듯했다. 뒤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이들의 표정을 살폈지만 불편한 것은 기자뿐인 듯했다. 어떤 이들은 신문을 꺼내 읽거나 자신도 휴대전화를 꺼내 수다를 떨고 있었다.
책은 구체적 사례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거시적인 경제 현상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한다. 저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을 소득 불평등과 금융시장의 팽창에서 찾는다. 상위 1%가 가져간 소득 비율이 사상 최고점이던 시기가 두 차례 있었는데, 뒤이어 1930년대 대공황과 현재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이다.
저자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마이클 스펜서가 이끈 다보스 포럼의 ‘현안 위원회’가 인정한 것처럼 소득과 소비의 건실한 성장을 통해 안정적 경제를 이룰 수 있다”며 “일을 해도 빈곤해질 수 있는 사회에서는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소득 안정성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김순덕의 도발]‘이재명 리스크’ 민주당은 몰랐단 말인가](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439561.1.thumb.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