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향한 역사/김정인 지음/408쪽·2만2000원·책과함께

“조선 멸망의 최대 원인은 사실 궁정에 있다. 오늘날 세상의 입헌국들에서 군주는 정치적 책임이 없고 약정도 할 수 없다. 전제국가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국가의 명운이 전부 궁정에 달려 있다.”
1910년 경술국치 직후 중국 사상가 량치차오(梁啓超)는 대한제국 멸망의 원인 중 하나를 정치 구조에서 찾았다. 왕에게 실권이 없는 입헌군주정과 달리 전제군주정은 모든 국가협약의 주체가 왕이기 때문에 제국주의 침략이 상대적으로 더 용이하다는 논리다. 실제 한일강제병합을 주도한 이토 히로부미도 자서전에서 조선 전제정치의 덕을 봤다는 내용을 기술하기도 했다.
이 책은 19세기 말∼20세기 초의 우리 역사를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시각에서 재해석해 눈길을 끈다. 그동안 학계는 ‘내재적 발전론’과 ‘식민지 근대화론’ 논란에서 볼 수 있듯 조선후기 사회에서 자본주의 맹아를 찾는 데만 몰두했다. 저자는 그 이유를 “민주주의는 외부에서 수입된 제도라는 오리엔탈리즘적 편견과 선입견에서 (학계가)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녹두장군 전봉준은 재판 때 “서양에서 당을 만들고 집회를 열어 정부를 감시하는 조직을 민회라고 부른다. 동학도 그런 결사체일 뿐 도적 떼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동학농민군의 위상과 역할을 민주주의 조직으로 규정한 것이다.
저자는 국망 이후 독립운동사도 민주주의 쟁취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 1919년 3·1운동 직후 임시정부 수립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민주공화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점에 주목했다. 일제가 군부 파쇼체제로 식민지 조선을 억압한 데 대한 대응이기도 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3·1운동에서 민족독립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적 논리는 민주주의였다. 민족의 자유와 평등을 구현하는 것은 민족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독립해야 한다는 주장은 민족의 독립이 곧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구현돼야 함을 뜻한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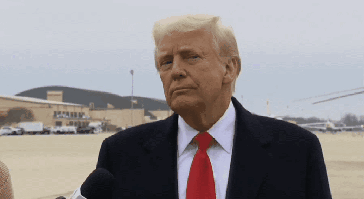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