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서 로큰롤/오쿠다 히데오 지음/권영주 옮김/354쪽·1만3500원·은행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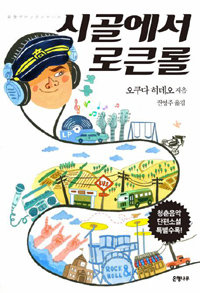
‘앨범 재킷처럼 호쾌하게 말을 타고 들판을 달리는 카우보이 느낌?’
서평을 쓰면서 음악을 찾아서 들어보기는 처음이다. 저자가 30년 만에 LP판을 다시 꺼내 듣고 진가를 알아봤다는 음악의 실체가 무엇인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록그룹 두비 브러더스의 1975년 앨범 ‘Stampede’의 히트곡 ‘Sweet Maxine’. 애석하게도 카우보이 이상의 특별한 감흥이나 표현이 떠오르지 않았다. 록 음악에 대해선 문외한인 데다 1990년대 학번의 한계라면 변명이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목조차 들어보지 못한 음악을 찾아보도록 궁금증을 일으킨 것은 순전히 저자의 톡톡 튀는 글 솜씨 덕이었다. 두비 브러더스를 언급하면서 저자는 “관심 없는 분들은 건너뛰고 읽어주시길. 만인에게 재미있을 에세이는 아니니까”라고 ‘쿨하게’ 썼다.
저자와 1959년생 동갑인 대중음악 평론가 임진모 씨는 “FM을 강타하고 있는 곡을 시골이라는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구하지 못해서 안달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그 절절한 심정을 안다. 저자에게 유사성을 넘어 사실상의 일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