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봄밤의 귀뚜리 ―이형기(1933∼2005)
봄밤에도 귀뚜리가 우는 것일까.
봄밤, 그러나 우리 집 부엌에선
귀뚜리처럼 우는 벌레가 있다.
너무 일찍 왔거나 너무 늦게 왔거나
아무튼 제철은 아닌데도 스스럼없이
목청껏 우는 벌레.
생명은 누구도 어쩌지 못한다.
그저 열심히 열심히 울고
또 열심히 열심히 사는 당당한 긍지,
아아 하늘 같다.
하늘의 뜻이다.
봄밤 자정에 하늘까지 울린다.
귀를 기울여라.
태고의 원시림을 마구 흔드는
메아리 쩡쩡,
메아리 쩡쩡
서울 도심의 숲 솟은 고층가
그것은 원시에서 현대까지를
열심히 당당하게 혼자서도 운다.
목청껏 하늘의 뜻을
아아 하늘만큼 크게 운다.
‘봄밤의 귀뚜리’는 뭔가 어색한 제목이다. 기왕 어색한 김에, 겨울이 되어 ‘봄밤의 귀뚜리’를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 시의 핵심은 봄밤에도, 귀뚜리에도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귀뚜라미는 예쁘지 않다. 특이하지도 귀하지도 않다. 그렇지만 몸집에 비해 목청이 참 크고 좋다. 그래서인지 귀뚜라미 울음소리에 빚진 노래나 시가 제법 많이 있다. 심지어 이 작품의 시인은 당장 그 앞에 무릎이라도 꿇을 태세다. 꿇을 만도 하다. 생명으로서의 신호를 저렇게도 잘 뽑아내고 있으니 말이다.
나민애 평론가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설조(雪朝)](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5/12/25/75569821.2.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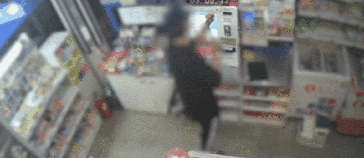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