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찍이 나는 ―최승자(1952∼)
일찍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마른 빵에 핀 곰팡이
벽에다 누고 또 눈 지린 오줌 자국
아직도 구더기에 뒤덮인 천 년 전에 죽은 시체.
아무 부모도 나를 키워 주지 않았다
쥐구멍에서 잠들고 벼룩의 간을 내먹고
아무 데서나 하염없이 죽어 가면서
일찍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잠시 스쳐갈 때 그러므로,
나를 안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너를모른다 나는너를모른다.
너당신그대, 행복
너, 당신, 그대, 사랑
내가 살아 있다는 것,
그것은 영원한 루머에 지나지 않는다.
간밤 엉망으로 취한 젊은이 하나가 동네 골목에서 고함치는 걸 보았다. “다 죽여 버릴 거야!” 웩웩 토하고 나서 다시 소리 질렀다. “씨×, 다 죽어 버릴 거야…!” ‘죽여 버릴 거야’가 ‘죽어 버릴 거야’로 잘못 발음되어 나온 그 순간이 마음 아팠다. 세상을 향하던 적의가 돌연 자기를 겨누었을 때, 숨겨 뒀던 속마음이 말실수 가운데 드러난 것 같아서였다. 뭐 하나 뜻대로 되는 게 없을 때 인간은 차라리 자기를 해치고 싶어지는 걸까.
‘일찍이 나는’은 편하고 무난한 시들과는 달리, 자기 삶을 거의 자폭적인 붓질로 그려 낸다. 시인은 곰팡이, 오줌 자국, 시체에 불과한 것으로 제 존재를 문대 버린다. 그것들엔 온전한 생명이 없다. 그러니 살아 있다는 것은 허망한 ‘루머’에 그친다. 삶을 루머라 여기는 사람을 타인이 쉬 이해하거나 섣불리 위로하기는 어렵다. 대체 왜 이러는 걸까. 아마도 그녀는 우리 삶의 실상이 삶과는 전혀 다른 어떤 것이거나, 저 취한 젊은이의 어두운 밤처럼 자살에 가까운 고통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힘겹게 보여 주려 하는 듯하다.
이영광 시인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이영광의 시의 눈]함민복씨의 직장](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5/12/28/75597395.2.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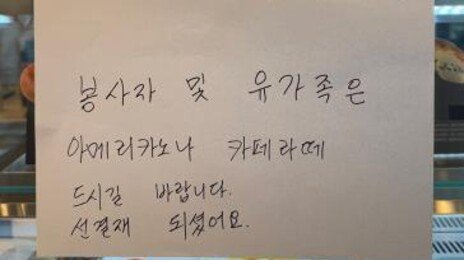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