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겨울 강 ―박남철(1953∼2014)
겨울 강에 나가
허옇게 얼어붙은 강물 위에
돌 하나를 던져 본다
쩡 쩡 쩡 쩡 쩡
강물은
쩡, 쩡, 쩡,
돌을 튕기며, 쩡,
지가 무슨 바닥이나 된다는 듯이
쩡, 쩡, 쩡, 쩡, 쩡,
언젠가는 녹아 흐를 것들이, 쩡,
봄이 오면 녹아 흐를 것들이, 쩡, 쩡
아예 되기도 전에 다 녹아 흘러 버릴 것들이
쩡, 쩡, 쩡, 쩡, 쩡,
겨울 강가에 나가
허옇게 얼어붙은 강물 위에
얼어붙은 눈물을 핥으며
수도 없이 돌들을 던져 본다
이 추운 계절 다 지나서야 비로소 제
바닥에 닿을 돌들을.
쩡 쩡 쩡 쩡 쩡 쩡 쩡
겨울과 밤을 시련으로, 새벽이나 태양, 봄 따위를 희망으로 계열화하는 것은 시의 오래된 관례다. 자연의 상태를 빌려 인간 삶의 형편을 드러내고 싶어 했기 때문일 것이다. 천변만화를 품고도 궁극의 질서를 잃지 않는 자연의 운행에서 현실에 깃들여야 할 순리를 찾는 일. 내일도 해는 뜰 것인가, 겨울은 끝나고 봄은 과연 또 올 것인가 하는 두려움과 기다림은, 태곳적부터 인류의 유전자에 찍힌 생존 열망의 핵심이다.
의미심장한 것은 “쩡”이라는 의성어다. 얼음이 돌을 튕기는 이 소리에 벌써 어떤 균열의 조짐이 묻어난다면 과장일까. 이것은 얼음의 소리지만 동시에 얼음이 깨지는 소리다. 무엇보다도 얼음에 돌이 날아가 부딪쳐 나는 소리다. 시대의 어둠이란 것도 최고조에 달했을 땐 홀연 빛의 금이 가는 건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려면, 오는 자연의 신호에 호응하여 이쪽에서도 무슨 신호 같은 걸 보내기는 해야 할 것이다.
이영광 시인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이영광의 시의 눈]다음에](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6/01/11/75827209.2.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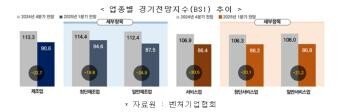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