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ㅡ박소란(1981∼)
그러니까 나는
다음이라는 말과 연애하였지
다음에, 라고 당신이 말할 때 바로 그 다음이
나를 먹이고 달랬지 택시를 타고 가다 잠시 만난 세상의 저녁
길가 백반집에서 청국장 끓는 냄새가 감노랗게 번져 나와 찬 목구멍을 적시고
다음에는 우리 저 집에 들어 함께 밥을 먹자고
함께 밥을 먹고 엉금엉금 푸성귀 돋아나는 들길을 걸어보자고 다음에는 꼭
당신이 말할 때 갓 지은 밥에 청국장 듬쑥한 한술 무연히 다가와
낮고 낮은 밥상을 차렸지 문 앞에 엉거주춤히 선 나를 끌어다 앉혔지
당신은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바삐 멀어지는데
나는 그 자리 그대로 앉아 밥을 뜨고 국을 푸느라
길을 헤매곤 하였지 그럴 때마다 늘 다음이 와서 나를
데리고 갔지 당신보다 먼저 다음이
기약을 모르는 우리의 다음이
자꾸만 당신에게로 나를 데리고 갔지
날을 뜻하는 말 중 어제와 오늘은 순우리말인데 내일(來日)만은 한자말이란 지적을 어느 책에서 읽은 적이 있다. 전란과 학정에 시달리느라 앞일을 점치기 어려웠던 우리 민족의 삶이 언어에 반영된 걸까. 어찌될지 모르는 낯선 시간을 뭐라 이름 짓기 어려워 외국말을 꾸어다 쓴 것일까. 이 시의 ‘다음’이란 말도 아마 내일을 뜻할 터이다.
내일이 좀체 안 보이는, 오늘의 수많은 젊음들의 초상인 듯해 읽는 마음이 아리다. 그런데 시의 화자는 자꾸 어긋나는 그 기약의 행로를 하염없이 따라간다. 오지 않는 다음 너머에 또 다른 다음이 오고 있다는 걸까. 간절히 바라지만 희미하고, 희미해서 더 간절했을 그 앞날을 내일의 내일, 그러니까 모레라 이름 짓고 싶다. 모레는 순우리말이다. 다행히도, 시의 말미에 가서는 기약 없는 다음이 오히려 화자를 더 확고하게 당신에게로, 당신과의 사랑에게로 데려간다.
이영광 시인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이영광의 시의 눈]물 위의 암각화](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6/01/18/75968071.2.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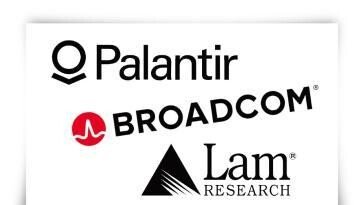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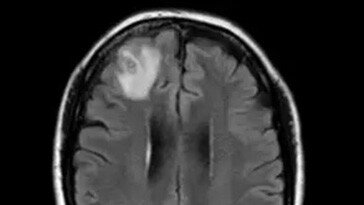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