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캡투어

‘나를 만나러 가는 길. 모두가 순례자이고 모두가 여행자인 길. 그저 삶의 무게만큼 지고 걷는 길. 한 벌의 여벌 옷과 양말 세 켤레 그리고 카메라와 내 두 발을 지켜줄 신발과 지팡이. ‘카미노 데 산티아고로 가는 길’ 그 기나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궁금하지만 그래서 자꾸 너에게 묻고 싶지만 오늘은 참을게, 그냥 너를 보듬어 줄게. 수많은 순례자들의 질문에 답하느라 지쳤을 너를 위해 오늘은 내 작은 어깨를 내어줄게. 편히 쉬렴.’
―김진아 작가 ‘바람이 되어도 좋아’ 본문 중에서
며칠을 걸었을까 작은 산을 몇 개나 넘었을까. 카미노 위 시간은 멈추었다. 끝없이 밀밭이고 끝없이 하늘이다. 초록과 파랑 그리고 붉은 길. 딱 세 가지의 색만 존재할 뿐. 끝을 헤아릴 수 없는 수평의 세상. 수많은 순례자들이 아픈발을 떼며 스쳐 지나가지만 그들 얼굴은 이상하리만큼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내가 그러하듯이. 새벽길에는 상큼함을 느끼고 저녁이면 여유를 느끼듯이. 용서할 수 없었던 과거를 길 위에 하나씩 버리듯이. 하늘의 별보다 많은 길 위를 걷는 수많은 사람들. 혼자 걷는 사람, 여럿이 걷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걷는 사람, 헤어질 사람과 걷는 사람, 옛날의 순례자처럼 걷는 사람, 악기를 가지고 걷는 사람, 개를 데리고 걷는 사람, 그저 걷기 위함이지 걸으며 무언가를 목적하지 않았다는 것, 그저 행복하게 걷자고 했던 다짐, 조금은 버려두고자 했던 다짐, 우리가 길 위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길 위에서 내려둘 수 있다는 것 버리자고 했던 그 또한 욕심이라는 것. 이 길이 바로 산티아고 순례길이다. ‘김진아 작가와 함께하는 산티아고 순례길’은 끝없는 밀과 보리의 농경지가 펼쳐져 나를 찾아가는 여정의 평화롭고 조용한 메세타 지역. 로마시대의 유적부터 로마네스크 양식의 성 이소도로 왕립 대성당, 장엄한 고딕 양식의 레온 대성당, 섬세하고 기교적인 16세기 스페인 플래테레스크 양식의 르네상스 시대 산마르코스, 가우디의 ‘카사 데 보티네스’를 만날 수 있는 레옹,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에 영감을 불러 일으킨 오르비고 다리의 비야르 데 마사리페를 지난다. 그리고 프랑스길, 로마길, 카미노 모사라가 모두 합쳐져 프란시스코, 바르톨로메, 산토실데스, 오비스포 알코올레아, 카테드랄 같은 많은 아름다운 광장과 17세기 바로크 양식의 시청사가 있는 아스토르가, 마을 인구가 체 50명도 안되는 작은 산타 카탈리나 마을, 산티아고 순례길을 먼저 걸었던 이들의 염원을 엿볼 수 있는 ‘순례자 야고보 길’의 영원한 상징 푸에르토 이라고(철 십자가), 중세 구시가지의 백미 템플기사단 성을 만나볼 수 있는 폰페라다 등 순례길 최고의 하이라이트 지역만 모아 17일간의 여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김 작가는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삼성전자연구원으로 근무하다 서른 살이 되던 해 국내여성 최초로 남극점을 크로스컨트리로 밟으며 인생의 쉼표를 찍었다. 그 쉼표가 오늘까지 이어져 길 위의 소중한 기억들을 글과 사진으로 독자들이나 여행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문의 레드캡투어 02-2001-4733
황효진 기자 herald99@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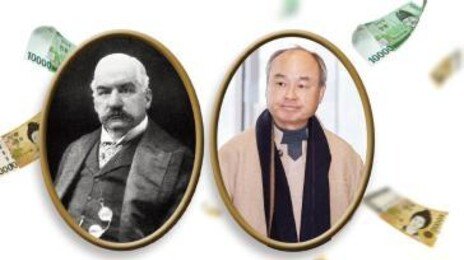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