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 제27권 ‘춘명일사’ 편에 명태가 소개된다. 명천에 사는 태씨 성을 가진 어부가 낚시로 물고기 한 마리를 낚았다. 고을 아전이 도백(道伯)에게 올렸는데 도백이 이 물고기를 맛있게 먹고 이름을 물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자 도백이 “명천 사는 태 어부가 잡은 물고기니 명태라 하면 좋겠다”고 하였다. ‘명태’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다.
이 이야기의 뒷부분에는 명태가 많이 잡혀서 팔도에 퍼졌고, 이름이 ‘북어’라는 점과 노봉 민정중(1628∼1692)의 예언(?)이 실려 있다. ‘300년 뒤에는 이 고기가 지금보다 귀해질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유원은 ‘원산을 지나는데 명태가 마치 오강(五江·한강 일대)에 쌓인 땔나무처럼 많아서 그 수효를 헤아릴 수 없었다’고 적었다.
명태라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처음 나타나는 것은 효종 3년(1652년) 9월의 ‘승정원일기’ 기록이다. ‘강원도에서 대구알젓 대신 명태알젓이 왔으니 해당 관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음 달인 10월에도 과일과 생선이 상했고, 역시 대구알젓 대신 명란이 올라왔으니 담당 관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사옹원 제조가 보고한다.
18세기에는 명태가 자주 등장한다. 시골에 사는 노인에게 구호물자로 곡식, 장과 더불어 ‘명태 한 마리’를 주었으니 인색한 지방 관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도 나타난다. 희한하게도 조선 초기 기록에는 명태나 북어가 등장하지 않는다. 해류의 온도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잡히지 않았거나, 흔하게 먹지 않았거나 혹은 먹으면서도 이름을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 효종과 민정중의 17세기를 지나면서 명태는 자주 등장한다.
민정중보다 160년 후 사람인 오주 이규경은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 ‘북어’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우리나라 동북 해안에 있는 물고기다. 폭이 좁고 길이가 1척(30cm) 이상으로 길다. 머릿속에 오이 같은 타원형의 뼈가 있다. (…) 이름은 북어인데 속칭 명태라고 부른다. 봄에 잡은 것은 춘태, 겨울에 잡으면 동태(冬太)다. 동지 무렵 시장에 나오는 것은 동명태(凍明太)다. (…) 흔해서 천하지만 귀하게 먹는다. 늘 먹으면서도 그 이름을 모른다.’
일제강점기에도 가끔 명태 어획량이 줄어들기도 했다. 동아일보 1926년 6월 1일의 기사에는 ‘조선 명태가 일본으로 이사를 갔다는 것은 이미 보도한 바와 같거니와, 그 대신 멸치가 많이 잡힌다. 명태의 주요 산지는 함북 청진, 경성군, 명천군 양화 등’이라는 내용이 있다. 역시 동북 해안이다.
언론인 고 홍승면 씨가 공개한 ‘북어대가리 사용법’을 전한다. ‘북어대가리를 의뭉한 불에 바싹 굽는다. 태우지 말아야 한다. 이걸 유리잔에 넣고 뜨겁게 덥힌 청주를 붓는다. 접시로 잠시 덮어두었다가 불을 붙인다. 푸른색 불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일식집에서 흔히 보는 복어 지느러미 대용품임을 알 수 있다. 이름이 낭만적이다. 이른바 ‘북어두주(北魚頭酒)’다.
참 흔한 물고기지만 귀하게 썼다. 살은 탕으로 끓였다. 얇게 썰어 전으로, 말린 다음 제사에 쓰거나 혹은 탕으로 먹었다. 아가미와 알, 내장으로 젓갈을 담갔다. 이제는 보기 힘들어진 ‘명태순대’는 함경도의 별미다. 명태 속에 나물과 곡물을 넣고 익힌 것이다.
황광해 음식평론가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황광해의 역사속 한식]미나리](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6/03/15/76996722.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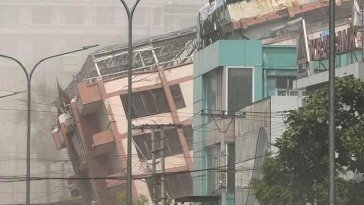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