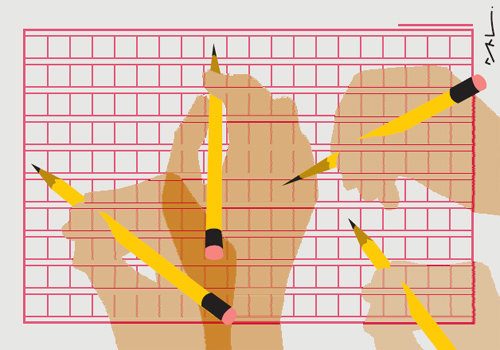
일본 작가 오자키 고요(尾崎紅葉·1868∼1903)는 글 쓸 때마다 고민했다. 자꾸만 문장의 세로줄이 어긋나고 글자 모양도 서로 다르게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는 1659년부터 종이를 팔아 온 가게 겐시로의 주인과 상의했다. 주인은 종이에 격자 틀을 그려 한 칸에 한 글자씩 적어 넣는 용지를 만들었다. 원고지가 탄생한 것이다.
이제 원고지의 자리는 A4 용지가 차지했고 육필(肉筆)은 전설의 반열에 올랐다. 전남 보성군 벌교읍의 태백산맥문학관에 전시돼 있는 조정래 소설 ‘태백산맥’의 육필 원고 1만6500장이 전설의 예다. 빈 원고지를 앞에 둔 막막함과 ‘무섬증’은 작가에게도 예외는 아닌가 보다. ‘순백의 용지/붉은 칸막이/고작 이것인데/내 무섬증은 부풀어/둑을 넘는다.’(김남조의 ‘원고지’ 중)
컴퓨터 문서 작성에 비해 원고지는 느리고 불편하다. 연필이면 지우개로, 볼펜이나 만년필이면 수정액이나 수정테이프로 지워야 하며 그도 아니면 죽죽 줄을 그어야 하니, 원고지에는 생각의 흔적이 남는다. 생각의 길이 어디로 향하다가 어디에서 깊이 고민했는지 원고지를 보면 짐작할 수 있으니 육필 원고는 작가 연구에 요긴한 자료다. 작가 김훈이 말한다. “나는 컴퓨터를 쓰지 않는다. 연필로 글을 쓴다. 어깨에서 손끝까지 힘을 주고 꾹꾹 눌러쓴다. 내 몸으로 글을 밀고 나간다는 육체감이 좋다.”
일본에서 인공지능이 쓴 단편소설이 문학상 1차 심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이다. 하지만 바둑돌을 반상에 착점할 때 느끼는 감각질은 이세돌 9단 앞에서 직접 돌을 놓은 아자 황 박사의 몫이었다. 작가 최인호는 암 투병 중에 “빠진 오른손 가운데 손톱의 통증을 참기 위해 고무 골무를 손가락에 끼고, 빠진 발톱에는 테이프를 친친 감고, 구역질이 날 때마다 얼음 조각을 씹으면서 미친 듯이 20매에서 30매 분량의 원고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집필했다.”(유고집 ‘눈물’)
서울 연세로 홍익문고 앞 보도 바닥에 핸드프린팅과 함께 동판에 새겨진 최인호의 말은 “원고지 위에서 죽고 싶다”이다. 감각질에 대한 이 처절한 사랑을 대신할 인공지능은 없다.
표정훈 출판평론가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표정훈의 호모부커스]사라져가는 독서세대](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6/04/18/77635461.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