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벨 문학상 다음으로 권위 있는 문학상을 받았다.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강 씨의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수상에 한국인은 환호했다. 출판 관계자들도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채식주의자’는 17, 18일 단 이틀 만에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에서 모두 3만 권이 훌쩍 넘게 팔렸다. 종이책이 동나자 독자들은 전자책으로 몰리고 있다. ‘채식주의자’를 출간한 창비는 그야말로 수상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한데 정작 창비는 영국 런던 시상식장에 직원을 한 명도 보내지 않았다. 창비는 수상 소식이 이미 다 알려진 17일 오전 11시경에야 수상 내용과 한 씨, 번역자 데버러 스미스 씨의 약력 등이 간단히 적힌 자료를 냈을 뿐이다. 창비 관계자는 “수상 가능성은 높게 봤다. 하지만 한 씨가 시상식에 요란하게 가는 걸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어서 직원을 보내지 않았다”며 “시상식 초청장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씨의 일정은 영국 출판사인 포르토벨로가 챙겼다.
현장에 직원을 한 명이라도 파견해야 했다는 건 ‘작가를 모시라’는 뜻이 아니다. 세계적인 문학상을 받는 현장을 지켜보고 해외 언론의 분위기와 독자들의 반응을 확인하라는 것이다. 이는 국제적 감각을 높일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이고 출판사로서도 큰 자산이 된다. 한국 작가가 앞으로도 큰 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독자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좋을지를 런던 현장에서 발견할 수도 있다. 설사 한 씨가 상을 못 탔어도 이런 적극성을 갖고 임할 필요가 있었다.
출판계는 독자들이 줄고 있다며 지원을 호소한다. 지원과 격려를 받으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정작 출판계의 빅이벤트가 떠올랐는데도 소극적 행보에 그치고 있는 창비의 모습을 보노라면 아쉽기만 하다. 한국 문학의 세계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요즘, 출판사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길 바란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문화好통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오늘과 내일
구독
-

오늘의 운세
구독
-

노후, 어디서 살까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문화好통/손택균]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건축, 無冠이 실패는 아니다](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6/06/02/78450602.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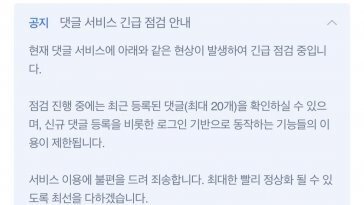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