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성시경의 축가’라는 공연 예매 포스터를 보고서 엄마 생각이 대뜸 났다. 엄마는 성시경의 대단한 팬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큰 체격이 주는 든든함과 감미롭고 달콤한 목소리가 좋다며 곧잘 그의 노래를 듣곤 했다. 새 앨범을 한창 들을 때는 몇 곡조를 흥얼거렸고 나와 함께 드라이브를 하며 그의 히트곡들을 목청껏 따라 부르기도 했다.
그러다 내가 결혼을 하고서는 그럴 여유가 잘 나지 않아 영 아쉬웠던 차에, 이번 공연을 기회로 모처럼 모녀 데이트 겸 라이브 음악 감상의 시간을 가지면 딱이겠다 싶었다. 그런데 엄마는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이셨다. “아이고 그 콘서트가 얼마나 비싼데, 뭐 하러 그런 데 돈을 쓰냐”며 탐탁지 않아 하시는 게 아닌가. 하지만 어르신들의 거절은 때로 거절이 아닐 수 있음을 배웠기에, 과감하게 예매를 해버리곤 엄마에게 통보했다. “몰라, 그날 시간 비워둬. 벌써 표 샀단 말이야.”
엄마는 못 이기는 척 알겠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이내 도착한 엄마의 문자메시지에 한참을 웃을 수밖에 없었다. ‘딸, 성시경 CD 좀 보내줄래? 콘서트 가기 전에 예습하려고. 나 너무 설렌다∼.’ 마다할 때는 언제고 소녀처럼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미리 듣고 있을 엄마의 모습을 상상하니 기분이 좋았다. 봄날 야외 공연장에서 엄마와 함께 보낼 시간을 떠올리며 들뜬 마음으로 공연 날을 손꼽았다.
그 다음 날이었다. 출근 후 정신없이 오전을 보내고 나니 휴대전화에 엄마의 부재중 전화 한 통이 남아 있었다. 발신 버튼을 눌렀는데 수화기 너머에서 엄마가 숨이 넘어갈 듯 엉엉 울고 있었다. 심장이 덜컥 발등에 떨어지는 기분으로 다급히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아니다, 별일 아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재차 묻자, 그제야 엄마는 꺼이꺼이 목을 놓던 울음 사이에 겨우 한마디를 뱉었다.
“희야, 고맙대이.”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엄마는 딸이 힘들고 어렵게 돈을 버는구나 싶어 내내 마음이 쓰이셨다고 했다. 그렇게 고생해서 번 돈으로 매진된 비싼 공연 표를 어렵게 구해 엄마를 모시고 간 것이 너무 고맙고 미안해 눈물이 쏟아졌다는 것이다. 지난 어버이날 아빠가 사려고 벼르던 모자를 선물한 것도 참 고맙다고 덧붙이셨다. “아빠도 니한테 고맙단다. 돈도 돈이고 니가 마음을 이렇게 써준다는 게 참말 고맙대이.”
그만 울라는 뜻으로 아무렇지 않은 듯 전화를 끊었지만 그 이후로 마음이 계속 이상했다.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잘 살았제” 하던 엄마의 목소리가 마음에 탁 맺혔다. 사실 그동안 내가 받은 것에 비하면 새 발의 피도 안 되는 것에 감동하는 부모님이라니. 전날 저녁 공연에서 흠뻑 비를 맞고 몸살 기운이 돌아 아프던 머리가 두 배로 멍해졌다.
처음에 공연을 안 보려고 하시던 것, 공연을 기다리며 설레어 하시던 것, 폭우를 맞으면서도 즐거워하시던 것, 그리고 고맙다며 울음을 터뜨리시는 엄마의 모습을 차례로 떠올리며 나는 숙연해졌다. 시작부터 끝까지 자신보다 자식을 더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고, 또한 그러면서도 자신의 행복을 숨기지 못했던 소녀 같은 엄마의 마음도 느껴졌기 때문이다. 부모로 산다는 것은, 하고 싶은 일들을 애써 마다하고 정작 그것을 누리게 되더라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미안해하고 마는 것일까. 그렇다면 자식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참 여운이 많이 남는 비 오는 봄날의 음악 감상이었다.
우지희 능률교육 콘텐츠개발본부 대리
2030세상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딥다이브
구독
-

우리 동네 응급실
구독
-

사설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2030 세상/이어진]아픈 ‘코리안드리머’를 치료하며](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6/06/16/78690672.1.jpg)
![[박중현 칼럼]‘개혁 주체’에서 ‘개혁의 적’으로 바뀐 尹의 운명](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667355.1.thumb.jpg)
![‘레이디 맥베스’에 김 여사 빗댄 더타임스[횡설수설/김승련]](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667375.1.thumb.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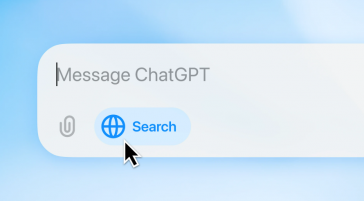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