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밤에 대하여/로저에커치지음·조한욱옮김/641쪽·2만8000원·교유서가

초등학생 때 본 반공(反共) 만화에서 지금껏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다. 북한 공산당의 압제에 시달리던 어린 주인공이 잠자리에 들면서 “이대로 영원히 잠만 잤으면…”이라고 혼자 뇌까리던 모습이다. 어렸을 땐 누구나 어두운 밤이 무섭고 특히 잠자리에 들기를 꺼리기 마련이다. 그런데 평생 잠만 자고 싶다니…. 주인공에게 밤은 암울한 현실에서 벗어나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싶은 도피처였는지 모르겠다.
이 책은 밤의 여러 문화사적 의미를 두루 파헤친 역작이다.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낮 못지않게 밤에도 나름의 풍요로운 문화를 영위했음을 보여준다. 나는 이 책을 보면서 서구의 생활사, 미시사 연구가 얼마나 앞서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다. 16∼19세기 유럽과 미국인들의 일기, 편지, 시, 소설, 그림 등 방대한 자료를 총동원해 당시의 밤 생활을 영화로 보듯 생생하게 그려냈다.
예컨대 중세 유럽인들에게 밤은 방금 꾼 꿈을 다시 한 번 기억해내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반추하는 특별한 시간이었다. 이는 가스나 전기를 이용한 인공조명이 없던 관계로 두 번에 걸쳐 잠을 나눠서 잤던 습성과 관련이 깊다. 해가 떨어진 직후부터 자정까지 깊은 잠을 잔 뒤 중간에 깨어나 1시간 동안 휴식하고 다시 동이 틀 때까지 짧은 수면을 취하는 식이다. 중간의 짧은 휴식 시간에 중세인들은 부부 관계를 갖거나 혹은 자신의 꿈을 반추했다. 어떠한 조명도 소음도 없는 무(無)의 공간에서 중세인들은 자아에 푹 빠져들 수 있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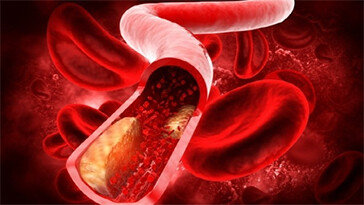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