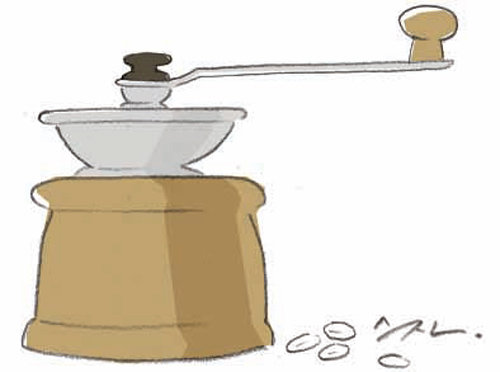
커피를 처음 마셔 본 게 언제였는지? 중학교 때 원예반 선생님은 우리가 고등학생이 되자 이따금 카페에 데리고 가셨다. ‘뜨락’이라는 데였는데 선생님 댁과 우리들의 집과도 멀지 않은 곳이었고, 알고 보니 우리 동네였다. 사실이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열일곱 살 때 그 카페에서 커피를 처음 마셔 본 것 같다. 크고 흰 잔, 그 안에 담겨 있던 까만 액체. 그 알 수 없는 맛…. 그 후 혼자 뜨락에 들락거리면서 나는 어른의 세계로 빠져 들어가게 된 것은 아니었을까.
8년 전에 처음으로 작업실을 얻었을 때 책장과 책상 말고도 필요한 물건이 너무나 많다는 데 깜짝 놀랐다. 공간이 좁기도 했지만 작업실이 수도사의 방처럼 보이길 원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물들만 들여놓기로 했다. 그렇게 해도 포기할 수 없는 게 커피를 마시기 위한, 주전자 핸드밀 서버 같은 핸드드립 도구들. 작업실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볶은 원두를 사다 먹는 것으로는 감당이 안 될 만큼 커피 양이 늘어버렸다. 이때다 싶어 로스팅에 관한 책들을 쌓아 놓고 독학을 시작했다.
생두를 볶으면 커피콩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콩 내부에 생긴 벌집과 같은 구조를 현미경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일명 ‘허니콤 구조’. 그 안에 커피의 맛을 좌우한다는 클로로제닉산, 카페인, 단백질 등의 성분이 부착된다. 일본의 한 공학도가 쓴 ‘더 알고 싶은 커피학’에서는 그 때문에 로스팅과 분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나의 첫 번째 커피 분쇄기는 실용적인 ‘칼리타’ KH3. 그 후 일 년에 한두 번 사치를 부리기도 하는데 클래식한 핸드밀을 구입할 때다. 보통은 위가 열려 있고 커피 가루가 담기는 서랍이 큰 제품을 사용하지만.
소복이 담긴 커피 가루에 물을 ‘내려놓는’ 느낌으로 주전자를 기울인다. 아래로 떨어지는 물의 힘으로 만들어진 맛. 아무도 없는데 오늘은 어째서인가 정성껏 두 잔을 내린다.
조경란 소설가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조경란의 사물 이야기]손수건](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6/10/05/80622796.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