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조경란의 사물이야기]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2일 03시 00분
글자크기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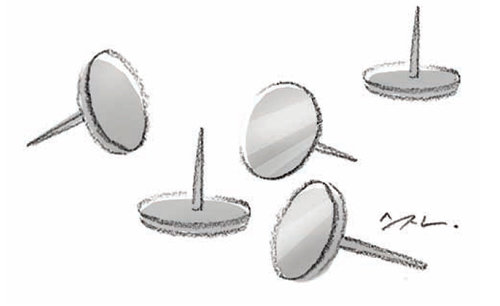
작업실 문 안쪽에 스케치북 사이즈만 한 코르크 보드 하나를 걸어두었다. 잊고 싶지 않은 글귀나 그때그때 필요한 메모들을 압정으로 고정시켜 놓고 작업실을 오갈 때마다 들여다보겠다는 생각에서였다. 마감 날짜가 지난 원고 청탁서를 떼려다가 오랜만에 그 보드 앞에 멈춰 서서 벌써 수개월째 혹은 1, 2년이 지나도록 떼어내지 못한 것들을 유심히 보게 되었다. 카뮈의 흑백사진도 있고 외우고 싶은 시와 메모들, 스승의 날에 받았던 학생들의 카드도 한 장 있었다. 단단히 눌러둔 압정을 빼내고는 그중 몇 개를 떼어낸다. 어느새 11월이니까 서랍 속이든 장롱이든 마음이든 천천히 정리를 시작하는 게 좋겠지. 촉이 짧고 대가리가 얇은 녹슨 압정 몇 개가 손바닥에 덜렁 남는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작가 아모스 오즈의 자전소설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춥고 외로운 집에서 혼자 노는 방법을 익혀야 했던 어린 오즈는 어느 날 아버지 책상에서 클립, 연필깎이, 공책 몇 권, 잉크병, 지우개, 그리고 압정 한 통을 가지고 와서는 그 문구용품들을 장난감 삼아 새로운 도시를 만든다. “연필깎이와 지우개는 급수탑인 큰 잉크병 양쪽에 세워두고, 연필과 펜으로 울타리를 삼아 전체를 에워싼 다음 압정으로 요새를 만”드는 방식으로. 그 후 전투가 벌어지면 어린 작가는 공책은 항공모함으로, 지우개와 연필깎이는 파괴자들, 클립은 잠수함으로, 압정은 지뢰로 만든다. 그 추운 방을 둘러싸고 있었던 것은 엄청난 양의 책들이었고.
압정에도 단점은 있다. 한 번 꽂으면 빼내기가 어렵고 핀과 머리에 녹이 슬어 얼룩을 만들고 바닥에 떨어지면 뾰족한 침이 위를 향해 발바닥에 꽂히기 쉽기 때문에 ‘손잡이가 있는 핀’, 즉 푸시핀이 만들어졌다. 수평면과 어떤 각도를 갖는 경사면을 이용하면 물체를 자르거나 구멍을 뚫을 때도 힘이 적게 든다고 한다. 예를 들면 가윗날, 칼날, 못과 송곳의 끝, 압정 핀 끝 부분의 뾰족하거나 살짝 기울어진 면. 누르고 찌르고 절삭하고 꽂는 데도 이런 과학의 원리가 숨어 있나 보다. 아무려나 문구 욕심이 많은 나는 푸시핀 이전의, 단점이 많은 이 압정을 새것으로 한 통 더 갖고 있다.
조경란 소설가
트렌드뉴스
-
1
[단독]인니 대통령 31일 방한… KF-21 16대 계약 추진
-
2
미군 “악!”…1.6조 레이더, 930억 공중급유기, 440억 리퍼 11대 잃었다
-
3
조국, 한동훈 ‘대한민국 발탁’ 발언에 “尹 황태자였던 자의 자아도취”
-
4
靑 “김어준 유튜브 법적 조치 가능성”… 與서도 ‘金 손절론’ 확산
-
5
김지민, 남편 돈줄 취급 시댁에 이혼 언급 “매일 싸울듯” (이호선의 사이다)
-
6
아무것도 못했다…WBC 한국, 도미니카에 0-10 콜드패
-
7
“1억 원 이상 목돈 마련 하려면 ISA가 정답”[은퇴 레시피]
-
8
한국, 도미니카공화국에 0-10 콜드패…류현진, 국가대표 은퇴
-
9
“호르무즈 열어라”…트럼프, 이란 석유시설 파괴 불사 ‘경고’
-
10
장동혁측 “오세훈 컷오프”… 吳측선 “장수에 충분한 시간 줘야”
-
1
오세훈-장동혁 벼랑끝 대치, 블랙홀 빠진 국힘
-
2
[단독]인니 대통령 31일 방한… KF-21 16대 계약 추진
-
3
靑 “김어준 유튜브 법적 조치 가능성”… 與서도 ‘金 손절론’ 확산
-
4
한동훈 “내가 배신자? 나를 발탁한 건 尹 아닌 대한민국”
-
5
다카이치 “독도는 일본땅, 국제사회에 확실히 알리겠다” 망언
-
6
김의겸 새만금청장 8개월만에 사퇴…“입신양명 위해 직 내팽겨쳐” 비판
-
7
조국, 한동훈 ‘대한민국 발탁’ 발언에 “尹 황태자였던 자의 자아도취”
-
8
“장동혁 비판자를 선대위장에”…국힘 소장파 ‘리더십 교체’ 목청
-
9
김민석, 美서 트럼프 만나…대미투자법 등 논의한듯
-
10
아무것도 못했다…WBC 한국, 도미니카에 0-10 콜드패
트렌드뉴스
-
1
[단독]인니 대통령 31일 방한… KF-21 16대 계약 추진
-
2
미군 “악!”…1.6조 레이더, 930억 공중급유기, 440억 리퍼 11대 잃었다
-
3
조국, 한동훈 ‘대한민국 발탁’ 발언에 “尹 황태자였던 자의 자아도취”
-
4
靑 “김어준 유튜브 법적 조치 가능성”… 與서도 ‘金 손절론’ 확산
-
5
김지민, 남편 돈줄 취급 시댁에 이혼 언급 “매일 싸울듯” (이호선의 사이다)
-
6
아무것도 못했다…WBC 한국, 도미니카에 0-10 콜드패
-
7
“1억 원 이상 목돈 마련 하려면 ISA가 정답”[은퇴 레시피]
-
8
한국, 도미니카공화국에 0-10 콜드패…류현진, 국가대표 은퇴
-
9
“호르무즈 열어라”…트럼프, 이란 석유시설 파괴 불사 ‘경고’
-
10
장동혁측 “오세훈 컷오프”… 吳측선 “장수에 충분한 시간 줘야”
-
1
오세훈-장동혁 벼랑끝 대치, 블랙홀 빠진 국힘
-
2
[단독]인니 대통령 31일 방한… KF-21 16대 계약 추진
-
3
靑 “김어준 유튜브 법적 조치 가능성”… 與서도 ‘金 손절론’ 확산
-
4
한동훈 “내가 배신자? 나를 발탁한 건 尹 아닌 대한민국”
-
5
다카이치 “독도는 일본땅, 국제사회에 확실히 알리겠다” 망언
-
6
김의겸 새만금청장 8개월만에 사퇴…“입신양명 위해 직 내팽겨쳐” 비판
-
7
조국, 한동훈 ‘대한민국 발탁’ 발언에 “尹 황태자였던 자의 자아도취”
-
8
“장동혁 비판자를 선대위장에”…국힘 소장파 ‘리더십 교체’ 목청
-
9
김민석, 美서 트럼프 만나…대미투자법 등 논의한듯
-
10
아무것도 못했다…WBC 한국, 도미니카에 0-10 콜드패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조경란의 사물 이야기]돼지저금통](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6/11/09/81236382.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