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조경란의 사물 이야기]달력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7일 03시 00분
글자크기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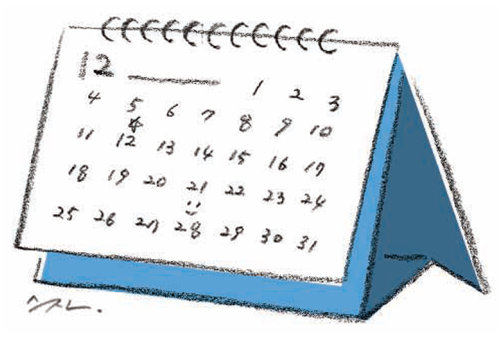
이맘때면 보험회사나 잡지사 같은 데서 보내주는 달력들을 우편으로 하나둘씩 받고는 했는데 올해는 소식이 없다. 단단하게 돌돌 말려온 벽걸이형이나 귀한 그림처럼 커다랗고 납작한 박스에 담겨오는 달력, 그리고 몇 개의 탁상용 달력들. ‘김영란법’의 영향인지 달력 업계에도 올해 주문과 물량이 대폭 감소되어 비상이 걸렸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벽걸이용보다 제작 가격이 평균 세 배 정도 높다는 탁상용 달력은 손에 넣기가 더 어려워질지도 모른다.
집에 걸어두는 달력이야 어떤 것이든 괜찮은데 작업실 책상에 올려둘 탁상용은 그렇지 않다. 약속들, 원고 마감, 학교 가는 날 등등을 기재해 두지 않으면 깜박 잊기 십상이라 네모 칸이 있어야 하고 음력도 표시돼 있어야 한다. 단순한 기준 같아도 그런 달력을 손에 넣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대개는 메모 칸이 그려져 있지 않거나 크기가 작거나 제작을 맡긴 곳의 홍보 글씨가 너무 눈에 띄게 새겨져 있으니까.
이제 한 장 남은 탁상용 달력을 조용히 넘겨 본다. 1월에는 단편소설을 썼고 2월에는 가족들과 관악산 무장애길을 산책했고 7월에는 폭염을 견뎠으며 10월에는 연남동이라는 데를 처음 가보았고 11월에는 김장을 담갔다. 달력을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니 꼭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기분이 든다. 365일을 요약한 노트, 1년을 압축시켜 보여주는 얇고 납작한 책. 매년 썼던 탁상용 달력들을 커다란 종이 박스에 모아둔 지 오래되었다. 벽걸이용은 처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깨끗한 뒷면을 볼 때면 유년 시절을 떠올리게 된다.
12월,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의 대부분을 후회만으로 보내지는 말아야 할 텐데. 한 장 남은 달력 귀퉁이에 2017년 1월이 깨알만 하게 프린트돼 있다.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해결하고 풀고 건너가야 할 일들이 첩첩산중이겠지. 어쨌든 선물같이 주어질 새 시간들이니 내년의 날짜들을 어제 읽은 시의 제목처럼 ‘첩첩의 꽃’으로 여기고 싶다. 그 여정의 마지막 달, 크고 작은 아쉬움 속에서도 올해 달력을 처음 펼쳤을 때의 마음으로 다시 묵묵히 일상을 가동시켜야 하지 않을까. 새 탁상용 달력 하나 사러 모처럼 문구점에 가야겠다.
조경란 소설가
트렌드뉴스
-
1
‘삐∼’ ‘윙∼’ 귓속 소리… 귀 질환 아닌 뇌가 보내는 잡음일 가능성[이진형의 뇌, 우리 속의 우주]
-
2
안보인다 했더니…“이란 모즈타바 공습 첫날 다리 부상, 은신중”
-
3
쑥대밭 이란 공군기지에 ‘미국산 F-14’ 전투기가…
-
4
年 100발도 못만드는 토마호크, 수백발 쏟아부어…美 무기부족 우려
-
5
“트럼프-김정은 사돈 만들어 세계 평화” AI 합성 콘텐츠 확산
-
6
“이란 군함 나포보다 침몰이 재밌어”…트럼프 막말에 비판 봇물
-
7
푸틴, 트럼프와 1시간 통화 “이란전 끝내라”… 中, 걸프국 접촉 확대
-
8
與한병도, ‘공소취소 거래설’에 “타협-거래의 대상 아냐”
-
9
뮤지컬 배우 남경주, 성폭행 혐의 검찰 송치
-
10
“20억 줄테니 팔라”…中도 탐낸 ‘서해의 독도’ 격렬비열도
-
1
“이란 군함 나포보다 침몰이 재밌어”…트럼프 막말에 비판 봇물
-
2
‘李공소취소-검찰개혁 거래설’ 파장…친명계 발끈, 국힘은 공세
-
3
[사설]“사드도 중동 차출”… 충분한 사전 협의가 동맹 현대화 안전판
-
4
[단독]美, 주한미군 사드 미사일 일부도 차출
-
5
韓 석유 비축량 208일치라지만… 실제 소비량 감안하면 68일치
-
6
트럼프 손녀 “파산하겠네” 전쟁중 초고가 쇼핑…미국인들 뿔났다
-
7
용돈 달라는 40대 아들에 격분, 흉기 휘두른 70대 아버지
-
8
張, 이틀째 ‘절윤 동의’ 침묵… 개혁파 “진정성 보일 인사조치를”
-
9
[오늘과 내일/문병기]국민의힘, 부정선거 음모론과도 절연해야
-
10
정성호 “검사들에 李공소취소 말한 사실 없다” 거래설 부인
트렌드뉴스
-
1
‘삐∼’ ‘윙∼’ 귓속 소리… 귀 질환 아닌 뇌가 보내는 잡음일 가능성[이진형의 뇌, 우리 속의 우주]
-
2
안보인다 했더니…“이란 모즈타바 공습 첫날 다리 부상, 은신중”
-
3
쑥대밭 이란 공군기지에 ‘미국산 F-14’ 전투기가…
-
4
年 100발도 못만드는 토마호크, 수백발 쏟아부어…美 무기부족 우려
-
5
“트럼프-김정은 사돈 만들어 세계 평화” AI 합성 콘텐츠 확산
-
6
“이란 군함 나포보다 침몰이 재밌어”…트럼프 막말에 비판 봇물
-
7
푸틴, 트럼프와 1시간 통화 “이란전 끝내라”… 中, 걸프국 접촉 확대
-
8
與한병도, ‘공소취소 거래설’에 “타협-거래의 대상 아냐”
-
9
뮤지컬 배우 남경주, 성폭행 혐의 검찰 송치
-
10
“20억 줄테니 팔라”…中도 탐낸 ‘서해의 독도’ 격렬비열도
-
1
“이란 군함 나포보다 침몰이 재밌어”…트럼프 막말에 비판 봇물
-
2
‘李공소취소-검찰개혁 거래설’ 파장…친명계 발끈, 국힘은 공세
-
3
[사설]“사드도 중동 차출”… 충분한 사전 협의가 동맹 현대화 안전판
-
4
[단독]美, 주한미군 사드 미사일 일부도 차출
-
5
韓 석유 비축량 208일치라지만… 실제 소비량 감안하면 68일치
-
6
트럼프 손녀 “파산하겠네” 전쟁중 초고가 쇼핑…미국인들 뿔났다
-
7
용돈 달라는 40대 아들에 격분, 흉기 휘두른 70대 아버지
-
8
張, 이틀째 ‘절윤 동의’ 침묵… 개혁파 “진정성 보일 인사조치를”
-
9
[오늘과 내일/문병기]국민의힘, 부정선거 음모론과도 절연해야
-
10
정성호 “검사들에 李공소취소 말한 사실 없다” 거래설 부인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조경란의 사물 이야기]연하장](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6/12/14/81826047.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