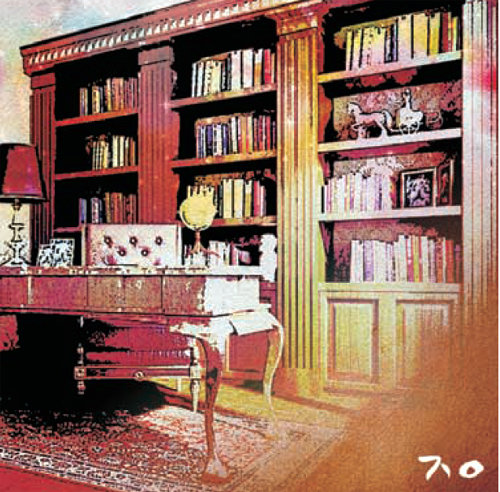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도스토옙스키 기념관은 작가가 1878년부터 별세할 때까지 2년여간 살던 곳으로, 이곳에서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1880년)이 탄생했다. 도스토옙스키는 서재에 좀처럼 다른 사람을 들이지 않았다. 그의 딸은 아버지의 습관을 이렇게 회고했다.
“서재의 모든 물건이 정해진 위치가 있었다. 집필할 때 가장 편한 위치에 배치했다고 하셨다. 신문지, 담배, 편지, 책 등 어느 것 하나 예외가 없었다.”
베이징의 루쉰 박물관 겸 루쉰 고거(故居)에는 작가가 ‘호랑이 꼬리(老虎尾巴)’라 이름 붙인 서재가 있다. 루쉰이 서재에서의 한순간을 말한다. “원고를 교정하고 편집하는데 석양이 서쪽으로 저물어 빛을 밝혀 주니 마치 등불 같았다. 순간 눈앞에 청춘의 여러 장면들이 전광석화처럼 지나가며 내 몸을 둘러싸 안았다.”
피렌체에서 추방당한 마키아벨리는 ‘군주론’(1513년)을 집필하고 친구 프란체스코 베토리에게 편지를 보냈다. ‘저녁이 오면 집에 돌아와 서재로 들어가네. 문 앞에서 흙먼지로 뒤덮인 일상의 옷을 벗고 궁중의 의상으로 갈아입지. 이 네 시간 동안만은 아무런 고민도 없다네. 모든 근심 걱정을 잊어버린다는 말일세. 쪼들리는 생활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다네.’
집에서도 가족들이 각자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기 일쑤인 우리에게 90년 전 동아일보 독자 김용배 씨가 제안한다. “우리에게는 서재란 것이 없습니다. 사랑방은 서재와 비슷하나 남자만 쓰는 객실이며 부인에게는 아무 인연도 없습니다. 방이 부족해 어찌할 수 없으면 모르겠으나 될 수만 있거든 남녀노소 공동으로 쓰는 서재를 마련합시다.”(동아일보 1927년 1월 2일자 3면)
표정훈 출판평론가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표정훈의 호모부커스]묵독과 낭독](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7/02/06/82727057.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