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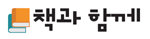

올봄 한 대학에서 글쓰기에 관한 수업을 맡았기에 학생들에게 좋은 글쓰기 책을 추천해 주고 싶었다. 아니, 그 전에 나 자신에게 그런 책이 필요했다. 지난번 ‘책과 함께’ 첫 원고를 쓰면서 간절해졌다. 극작가로서 희곡 쓰는 일을 해 오고 있지만 문장을 쓰는 일에는 늘 연극 대사 쓰는 것과 다른 어려움을 겪는다. 돌이켜보면 국어국문학과를 다녔음에도 글쓰기 훈련을 제대로 받을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까지 큰 스트레스를 받으며 글쓰기를 한 사람이 있을까. 말과 글에 까다롭고 엄정했던 두 대통령 탓에 저자는 과민성대장증후군을 앓는다.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 때 대통령을 수행한 그는 평양으로 가는 길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관장약을 먹은 뒤 끼니를 거른 채 버스를 탔다.
일화를 전하는 문장은 담담하다. 국가대표급 문필가임에도 기막힌 표현이나 윤기 흐르는 문장으로 글재주를 드러내지 않는다. 하지만 미사여구 없이도 마지막 장까지 흥미진진하게 읽힌다. 저자는 “글의 꾸밈보다 진실한 생각이 중요하며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문장이 좋다”는 자신의 주장을 그렇게 스스로 증명한다.
‘글은 곧 말을 옮겨 적는 것이며 말도 글도 쉽고 간명해야 한다’는 명제는 언론인이 쓴 다른 글쓰기 책에도 똑같이 담겼다. 소리 내어 읽으며 퇴고하라, 사례나 수치를 동원하라, 접속사를 자제하라 같은 세세한 지침 역시 다른 글쓰기 책에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었다. 말과 글의 차원이 다르다고 여겨 왔던 내게는, 소설가 구보 박태원의 치렁치렁 긴 문장을 사랑하며 문체와 수사가 명문을 낳는다고 믿었던 내게는, 연신 충격이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이 터진 뒤 이 책의 판매량이 늘었다고 한다. 이제, 자기 자신의 진실한 말과 글을 전해줄 새 대통령을 기다린다.
성기웅 극작가·연출가
책과 함께 >
구독 1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고양이 눈
구독 85
-

박중현 칼럼
구독 9
-

김창일의 갯마을 탐구
구독 38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책과 함께/박용완]음악은 ‘작곡가의 것’이 아닌 ‘나의 것’](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7/03/27/83535226.1.jpg)

![최재형 “인권 생각하면 ‘尹 구속 취소’ 맞지만 탄핵은 불가피” [황형준의 법정모독]](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1189347.1.thumb.jpg)

댓글 1
추천 많은 댓글
2017-03-20 14:45:48
그렇게 말과 글에 까다롭고 엄정하셨던 노짱께서는 왜 그리 막말을 일삼으셨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