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의 기쁨/금정연·정지돈 지음/240쪽·1만4800원·루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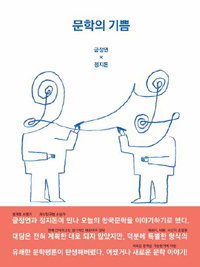
금정연 씨와 정지돈 씨. 1980년대생으로 최근 한국 문단에 활기를 불어넣는 서평가와 소설가다. 젊은 작가들의 문예집단인 이른바 ‘후장사실주의자’들이기도 하다.
이 책은 두 사람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작업한 ‘문학평론집’이다. 그런데 문학평론집 하면 떠오르는 까다로운 문학이론과 난해한 문장과는 거리를 둔다. 문장은 어렵지 않지만 어디로 튈지 모르는 대화, 시니컬한 유머로 가득하다.
가령 그들이 읽은 김태용 씨의 소설 ‘벌거숭이들’에 대한 리뷰는 이렇다. ‘김태용은 소설가 이상우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소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는 (모리스) 블랑쇼를 흉내 내지 않았다. 소설가 양선형은 (…) 사무엘 베케트의 ‘말론, 죽다’의 냄새를 맡았다고 했다. 김태용은 부정했다. 금정연 씨는 이오네스코가 연상됐다고 말했다. 이번에도 부정했다. 세 번의 부정. 그는 문학계의 베드로인가. 이후 그는 회개하였나.’ 입말을 살린 서평들은 처음엔 어색하지만 차차 읽는 맛을 들일 수 있다.
김지영 기자 kimjy@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