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땅고만을 추었다/오디세우스 다다 지음/296쪽·1만4800원·난다


책은 탱고를 ‘땅고’라고 표현한다. ‘탱고’와 ‘땅고’는 구분돼야 한다는 게 저자의 말이다. ‘땅고’는 정통 아르헨티나 탱고이고, ‘탱고’는 유럽의 사교댄스와 만나 과장된 동작으로 변형된 ‘콘티넨털 탱고’라는 것이다. 보통 우리가 TV에서 볼 수 있는 건 스포츠로 변형된 콘티넨털 탱고다. 기사에서는 익숙한 표현인 ‘탱고’로 쓴다.
책에 따르면 탱고는 원래 아프리카 흑인들의 춤, 혹은 흑인들이 춤추기 위해 모이는 장소를 뜻했다. 1860년경 아르헨티나에서 흑인 춤곡인 칸돔베와 쿠바의 춤곡 아바네라가 결합되면서 생겨났다. 탱고는 혼자서는 출 수 없는 커플댄스이고, 상상력이 요구되는 즉흥의 춤이다.
탱고는 아르헨티나 정치와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수많은 유럽인이 아르헨티나로 건너왔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탱고 바는 사람들로 흥청거렸다. 페론 대통령의 사회당 정권은 민족주의 성향을 갖고 있었기에 외국 음악을 제한하고 아르헨티나 음악을 장려했다. 저자는 “탱고를 춘다는 것은 나는 페론주의자라는 것을 육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었다”고 했다. 1950년대 중반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는 탱고를 탄압하고 로큰롤 등을 장려했다. 탱고 아티스트들은 군사정권의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페론주의자라는 혐의로 투옥됐다.
저자의 본명은 하재봉으로 과거 시와 소설, 영화평론을 썼다. 필명은 탱고 세계에서 쓰는 이름이라고 한다. 2004년 탱고에 입문한 뒤에는 탱고를 가르치는 한편 여러 페스티벌에서 탱고 부문 총감독을 했다.
저자는 “땅고를 추는 동안 우리는 마치 스승이 내려준 화두를 붙들고 동안거에 들어가 면벽참선하는 선승처럼 깊이를 알 수 없는 아득함을 느낀다”, “땅고를 추기 위해 밀롱가(사람들이 모여 탱고를 추는 장소)로 들어가는 순간 나는 나를 둘러싼 세계와 거대한 아브라쏘(포옹)를 하고 있는 것이며 상대를 안는 순간 또 다른 나의 자아와 아브라쏘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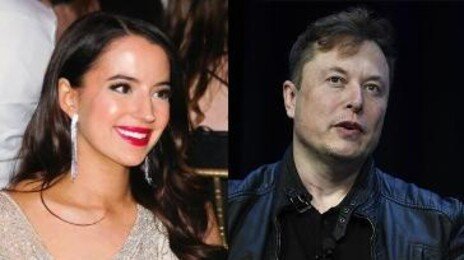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