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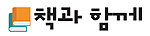
공원은 보자기처럼 그 안에 머무는 사람을 느슨하게 감싼다. 여기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대부분의 공원은 돈을 낼 필요도 없다. 남에게 방해되지 않는다면 하고 싶은 일을 얼마든지 느긋하게 할 수 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스스로 주인이 되는 공간이다. 숱한 시와 소설, 음악과 그림, 그리고 사업 아이디어가 공원에서 시작된다. 언뜻 그냥 다들 시간을 죽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새로운 가능성의 에너지로 충만한 곳이 바로 공원이다. 이곳에는 도약 전의 이완이 있다.
“외할머니는 어린 나를 이곳으로 자주 데리고 와서 오리에게 먹이를 주었다. 아늑하지도 한갓지지도 않았지만 신록이 우거진 이곳이 나는 좋았다.”
그렇기에 이 책은 세계 여러 도시의 공원 18개에 대한 친밀하고 생생한 보고서다. 전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 영국 건축가 노먼 포스터 등 여러 분야의 낯익은 인물들이 필자로 참여했다. 멀리서 조망하듯 쓰지 않고 개인적 경험과 관점을 드러냈다. 특정 사건에 대한 기억이나 개인 연애사에 역사적 사실을 엮어 놓아 읽을수록 매력적이다. 이탈리아 출신 사진작가 오베르토 질리의 사진도 일품이다.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공원 이야기를 같은 방식으로 묶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1997년 초 조성된 이곳 통의동 공원은 지난해 12월 청와대가 “경호상의 필요”를 이유로 인근 주택과의 맞교환을 통해 매각돼 사유지가 됐다. 동네 주민들과 함께 걸어둔 ‘공원을 지켜 주세요’ 현수막 빛깔이 햇빛과 비바람에 바래 간다. 언제 저 현수막을 내릴 수 있을까.
황두진 건축가
책과 함께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전승훈 기자의 아트로드
구독
-

허진석의 톡톡 스타트업
구독
-

횡설수설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책과 함께/백선희]버큰헤드호를 기억하듯 세월호를 결코 잊지 말라](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7/04/17/83891074.1.jpg)
![백년 전 만평, 사진으로는 담지 못한 진주 시위대의 목소리[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695191.1.thumb.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