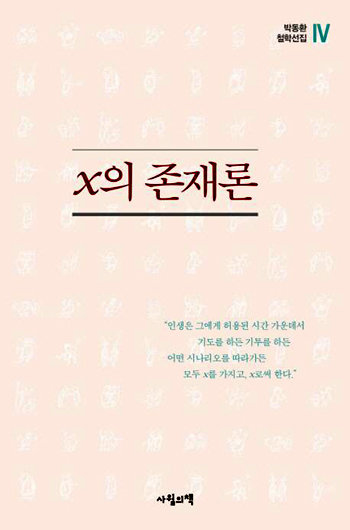


저자는 말한다. “이 나라에서 철학자라 불릴 만한 사람들은 오로지 외래의 언어와 사상의 전통을 모범으로 삼아 아랫사람들을 다스리거나 길들이는 일에 종사하는 데 그쳤다”고. 그 철학자들은 자신이 속한 역사 속에서 겪은 시대의 체험을 자신의 말로 사색하고 표현하지 못했다. 그저 외국의 사상을 읽고 전파하는 데 평생을 바쳤다. 그런 안일한 관행이 우리 철학의 역사를 지배했다. 지은이는 다시 말한다.
“철학책을 읽는다고 해서 철학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박동환은 평생 ‘우리의 철학’을 하기 위해 애쓴 인물이다. 중국이나 서구의 사상은 모두 지역적 한계를 지닌 철학인 까닭에 21세기의 보편적 철학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견해다. 그의 사유는 한국어를 통해 당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인식의 지평 너머 수십억 년에 이르는 존재의 역사를 향해 뿌리를 뻗는다.
책을 읽으며 화가 이우환이 쓴 짤막한 글이 생각났다. 화가는 그리스 여행을 갔다가 거기서 선물받은 돌멩이 몇 개를 우편으로 집에 부쳤다. 여행에서 돌아와서는 책상 위에 늘어놓은 돌들을 보면서 온갖 신화적 상상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런 그에게 부인이 말했다.
“그 돌들은 사실 집 앞에서 주워 온 거예요. 우편으로 보낸 돌은 처음에 뭔가 잘못 보낸 것이려니 생각하고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박동환의 ‘x의 존재론’은 한국의 인문학자 모두가 읽어야 할 책이다. 특히 한국 인문학의 미래를 열어갈 젊은 학자들에게 권한다. 물론 인문학도가 아닌 독자들에게도 한국 인문학의 최전선이 어떤 모습으로 형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분야를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세계의 사상을 탐색해 온 원숙한 철학자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이영준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책과 함께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고양이 눈
구독
-

어린이 책
구독
-

동아리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책과 함께/황두진]질문 없는 자동화된 지식을 경계한다](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7/05/15/84357347.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