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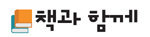
책을 집어들 때부터 걱정 반 기대 반이었다. 나는 ‘다원(多元)예술’이라 불리는 경향의 작품을 즐기는 편이 못 된다. 예술의 전통과 관습에 시비 거는 방식을 경계하는 걸 보면 아무래도 난 꽤 보수적이다.
그럼에도 이 책을 택한 건 제목에 끌려서다. ‘미래 예술’이라니 궁금하지 아니한가. 그래, 난 어중간하고 모순적이다. 급진적 파격에 겁을 내면서도 관습적 창작에는 싫증을 느끼니까. 외국 물 좀 먹었다는 사람들이 서양 예술 경향을 수입해 아는 척한다고 못마땅해하면서도 그런 얘기에 자주 귀가 솔깃하니까.

이어지는 챕터는 ‘춤이란 무엇인가?’ ‘몸이란 무엇인가?’다. 슬슬 어려워진다. 언급되는 작품도 못 본 것투성이다. 활자들이 난해한 퍼포먼스를 벌이기 시작한다.
다섯 번째 챕터는 ‘언어란 무엇인가?’. 여러 음성언어를 아카이빙 했다는 ‘말들의 백과사전―모음곡 2번’이나 이영준의 글쓰기 퍼포먼스가 호기심을 끈다. 이어서 극장이란, 실재란, 관객이란 무엇인가로 이어진다. 정석적인 흐름이다. 미술을 베이스로 한 새로운 개념의 창작도 다루지만, 결국 확장된 개념의 연극 혹은 공연예술로 논의가 수렴된다.
얼마나 이 책을 소화해낸 건지 모르겠다. 알 듯 말 듯한 퍼포먼스를 본 기분이다. 끄트머리에 색인이 있으니 사전처럼 꽂아두고 더러 꺼내봐야겠다. 블랙리스트 같은 옛 시대의 유령으로부터도 놓여났으니, 다시 미래의 예술을 기웃거려봐야겠다.
성기웅 극작가·연출가
책과 함께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청계천 옆 사진관
구독
-

광화문에서
구독
-

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책과 함께/박용완]좋아한다는 음악가 따로 평소 즐겨듣는 노래 따로](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7/06/12/84815338.1.jpg)
![‘올해의 작가상’ 개그맨 고명환 “죽을 뻔한 나를 구해준 비법은” [인생2막]](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681832.4.thumb.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