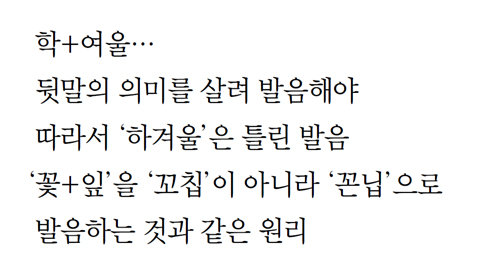

―학여울역에서 만나기로 했어.
‘하겨울’로 소리 낼 수도 있다. 앞말의 받침 ‘ㄱ’을 ‘여울’의 빈자리로 넘겨 소리 내면 ‘하겨울’이니까. 하지만 이는 표준 발음이 아니다. 왜 그런가. 단어는 혼자 존재하지 않는다. 유형을 이루어 비슷한 원리로 소리를 낸다. 그러니 제대로 원리를 알려면 같은 유형의 단어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어떤 경우도 ‘꽃잎’을 ‘꼬칩’이라 말하지 않는다. ‘ㅊ’을 그대로 넘겨 발음하면 ‘잎’이라는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다. ‘꽃’의 단독 소리인 ‘+’에서 ‘ㄷ’을 넘겨 ‘꼬딥’이라 말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의미의 손실은 더 작아지니까. 실제로 그런지는 문장 속에서 우리 발음으로 확인해야 안다.
―꽃잎을 따서 책갈피에 넣었어.
여기서 우리는 ‘꼬딥’이라 하지 않고 ‘꼰닙’이라 소리 낸다. 원래 없었던 ‘ㄴ’ 소리가 생겼다는 점에 주목하자. 앞말의 받침을 이동시키지 않고 뒷말에 ‘ㄴ’을 넣어 소리 내는 것이다. 이것이 뒷말이 ‘ㅣ’로 시작하고 의미를 가진 단어들의 발음 원리다. 외우고 있지 않은데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원리에 따라 소리 낸다. 우리의 머릿속 규칙이 가진 힘이다.
이 원리를 ‘학여울’에 적용해 보자. ‘ㅣ’로 시작하는 말이니 ‘ㄱ’이 빈자리로 넘어가기 전에 ‘ㄴ’이 덧난다. 이때 생긴 ‘ㄴ’ 때문에 ‘학’의 ‘ㄱ’이 ‘ㅇ’으로 바뀌는 일이 생긴다. ‘ㄴ’은 코에서 나는 소리이니 ‘ㄱ’ 위치에서 콧소리로 바뀐 것이다.
물론 이런 질문도 가능하다. 이런 복잡한 것을 굳이 알아야 하는가? 몰라도 된다. 하지만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는 이 원리로 소리 내고 있다. 그러니 표준어나 맞춤법의 원리를 이해하고 싶다면 우리의 입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아야 한다. 아래 단어들을 보자.
―솜이불(솜니불), 밤윷(밤7), 콩엿(콩8), 담요(담뇨), 색연필(생년필), 직행열차(지캥녈차), 늑막염(능망념), 남존여비(남존녀비), 신여성(신녀성), 내복약(내봉냑)
뒷말이 모두 의미를 가진 것들이고 ‘ㅣ’로 시작하는 것들이다. 앞서 우리가 본 발음 원리 하나로 이렇게 많은 단어의 발음을 한꺼번에 아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것이 우리가 스스로의 원리를 이해하는 방식이 갖는 힘이다. ‘육이오, 삼일절’은 이 원리를 적용할 환경이지만 ‘융니오, 삼닐쩔’이 원래 의미에서 더 멀어지므로 ‘ㄴ’이 첨가하지 않는다는 점도 곁들여 알아두자.
김남미 서강대 국제한국학연구센터 연구교수 국어국문학
맞춤법의 재발견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지금, 이 사람
구독
-

현장속으로
구독
-

손효림의 베스트셀러 레시피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맞춤법의 재발견]‘낫다’와 ‘낳다’ 표기의 복잡한 사연](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7/06/19/84945436.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