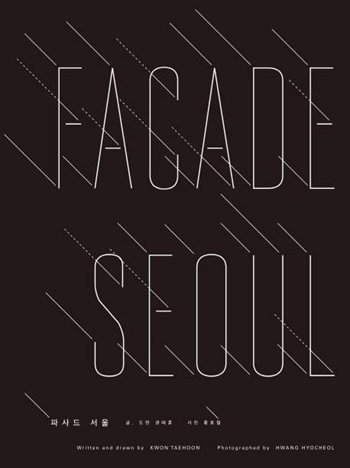

그런 생각은 몇 페이지 넘기지 않아 무너진다. 어디를 봐도 눈길 끄는 화려한 건물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 반대다. 설명을 읽지 않으면 도대체 어디 있는 건물인지조차도 알기 어렵다. 이 책의 주인공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서울 구도심의 낡고 초라한 건물들이다. 건물명이랄 것이 없고 있어봐야 독자들이 알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에, 건물명 대신 주소만 기재했다. 을지로 123, 칠패로 12-16, 만리재로 188, 두텁바위로 160….

수록된 도면들의 완성도는 한마디로 압권이다. 기계적 정확성, 부분과 전체의 관계 밝힘, 빛과 그림자의 구분, 선의 위계 등 모든 요소가 엄격한 통제 속에서 풍성한 시각적 즐거움을 안겨준다.
타일 줄눈의 선을 따라가다 보면 창틀이 구성되고, 그것들이 모여 다시 건물 전반의 구조로 이어지다가 어느덧 외곽선을 이뤄 건물 밖 도로와 만난다. 모든 것은 연결돼 있다. 납작한 2차원이 아니라 울퉁불퉁한 3차원이다.
건물이 돌과 콘크리트와 유리로 구성된 실물이라면, 건축은 조직화된 정보다. 정보는 실물과 또 다른 그 자체의 독자적 생명과 의미를 갖는다. 그 어떤 말로도 이 책처럼 건축의 생명력을 잘 보여주기 어렵다.
황두진 건축가
책과 함께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DBR
구독
-

우아한 라운지
구독
-

이승재의 무비홀릭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책과 함께/백선희]지식이 대답이라면 무지는 질문이다](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7/07/03/85166136.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