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생각했어요. 아무와도 대화할 수 없는 언어가 모국어인 사람의 고독에 대해서요. … 만약 제가 사용하는 언어의 사용자가 오직 두 사람만 남았다면 말을 조심해야겠어요.―‘오직 두 사람’(김영하·문학동네·2017년)
소설가 김영하의 새 소설은 오직 둘만 아는 언어로 소통하던 두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그들의 유일무이한 세상은 아주 사소한 말다툼으로 무너진다. 의절한 채 수십 년이 지난 어느 날, 한 사람이 예고 없이 세상을 떠난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남은 사람은 홀로 ‘언어의 독방’에 갇혀버린다.주변의 사람들을 대할 때 매 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하자고 다짐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 사소한 말다툼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서 ‘다음에 더 잘하면 되겠지’, ‘언젠가 오해를 풀 날이 오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다행히 기회가 다시 오지만, 사소한 실수 이후 영영 볼 수 없게 되어버린 사람들도 있다. 그제야 ‘그때가 마지막일 줄 알았더라면’ 하고 때늦은 후회를 한다. 특히 그 후회가 절박해지는 순간은 나와 등진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을 때이다. 타인에게 떠난 그를 온전히 설명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고(故) 마광수 전 교수의 1991년 작품 ‘즐거운 사라’의 호가(呼價)가 25만 원으로 치솟았다. 외설적이고 저급하다고 출판금지까지 당했던 이 소설에 사람들은 뒤늦게 열광한다. 그를 손가락질하던 이들 가운데 일부는 그의 신격화에 나서고 있다. ‘오직 두 사람’의 한 구절을 인용하자면 이 모든 것은 사치품에 불과하다. “그는 천재였다”거나 “이 시대의 마지막 로맨티시스트였다”라는 상찬들은 마 전 교수의 마지막을 몰랐던 이들이 죄책감을 덜고자 만들어낸 한발 늦은 고해성사이자 자위수단일 뿐이다.
손가인 기자 gain@donga.com
책속의 이 한줄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여행스케치
구독
-

횡설수설
구독
-

딥다이브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책속의 이 한줄]연애와 사랑에까지 스며든 시장의 논리](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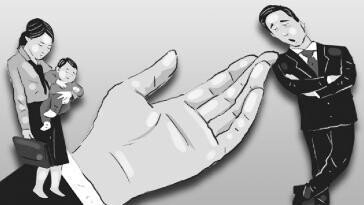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