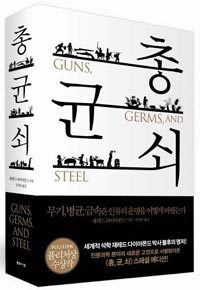
‘총, 균, 쇠’(사진)를 다시 읽기 시작했다.
계기는 유치하다. 얼마 전 술에 취해 터벅터벅 집에 가던 길. 목이 말라 편의점에 들렀는데, 점원이 눈을 사로잡았다. 아르바이트 학생일 듯한데, 한쪽 팔에 문신이 빽빽하게 들어선 게 아닌가. 침이 꼴깍 넘어가는데, 그의 손에 들린 두툼한 책 한 권에 또다시 눈길이 꽂혔다. 맞다. 미국 캘리포니아대의 재러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쓴 그 책이었다.
집에 돌아와 한참을 뒤졌더니, 곰삭은 종이 냄새가 밴 ‘고서(古書)’가 주인을 맞았다. 반가운 마음에 몇 장을 넘겼는데…. 어라, 매캐할 정도로 내용이 깜깜하다. 분명 읽긴 했었는데. 괜스레 ‘타투인(人)’에게 질투가 피어올랐다.
정양환 기자 ray@donga.com
종이비행기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따만사
구독
-

김도언의 너희가 노포를 아느냐
구독
-

손효림의 베스트셀러 레시피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종이비행기]‘시차적응’ 비결은 없을까](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