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의 시대, 인간을 다시 묻다/김재인 지음/372쪽·2만 원·동아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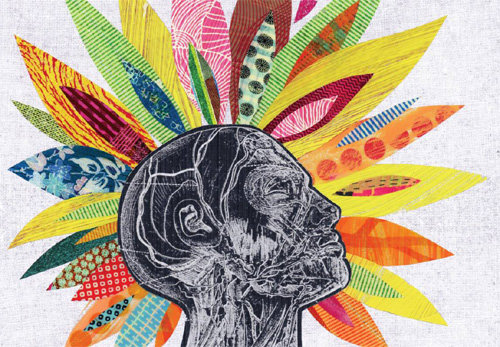

질 들뢰즈(프랑스 현대 철학자) 철학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저자는 “모든 철학은 당대의 자연과학과 나란히 가야 한다”며 이런 세태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다. 서울대 철학과에서 ‘컴퓨터와 마음’ 과목을 3년여 강의한 게 집필의 바탕이 됐다.
결론부터 보자. 가까운 미래, 인간을 뛰어넘는 초인공지능이 등장하고 인간을 지배할까? “아니다.” 인간은 목표를 스스로 정하지만 인공지능의 목표는 인간이 정해준다. ‘기계학습’이라는 말은 마치 기계가 인간처럼 공부한다는 오해를 만들지만 이 역시 인간이 정한 수행 기준에 따라 이뤄진다.
어쨌든 계산과 관련된 인간의 일, 알고리즘으로 짤 수 있는 일은 인공지능이 빠르게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간에게 남은 건 문제를 제기하고 목표를 세우는 일, 즉 창조적인 일이다. 창조성을 어떻게 배우나? 예술가처럼 살아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모든 사람이 예술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창작이 학습의 핵심 활동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별개로 책은 초인공지능보다 먼저 인간과 컴퓨터가 얽힌 ‘네트워크 마음’ 또는 ‘네트워크 지능’이 출현할 것이라고 봤다. 문제는 얽혀 들어갈 ‘인간이라는 버그’다. 네트워크 지능이 인간의 나쁜 특성도 지니게 될 소지가 크다는 얘기다. 정부나 기업이 ‘빅브러더’가 될 수도 있다. 마찬가지 이유로 만약 역공학(reverse engineering·완성된 제품을 분석해 작동 방식을 역으로 알아내는 공학) 방식으로 인간의 커넥톰(뉴런의 연결망)이 프로그램과 로봇으로 재현된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
인공지능을 처음 본격적으로 논의한 영국 수학자 앨런 튜링(1912∼1954)의 1950년 논문 ‘계산 기계와 지능’에는 참고문헌이 불과 9개밖에 없다고 한다. 참고문헌 중 하나인 새뮤얼 버틀러(1835∼1902)의 책 ‘Erewhon’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생물과 기계의 차이는 모호해진다. 튜링의 논문, 플라톤과 데카르트의 철학, 일본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를 비롯해 책이 발췌해 안내하는 여러 고전과 관련 자료를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거대하고 다양한 쟁점을 압축해 다루다 보니 키다리가 겅중겅중 뛰어가는 듯 서술됐다는 느낌도 없지 않다. 독자가 생각할 거리를 잽처럼 날리는데, 저자 스스로 탐구한 발걸음에 힘을 실은 잽이 한 방 한 방 묵직하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