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모두 환하고 아름다운 세계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꿈꾼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어두운 세계가 있으며 그곳에 대한 호기심과 욕망이 나올 뿐 아니라 분노와 혐오 또한 어슬렁거린다. 인생은 선(善)과 붙어 있는 악(惡)의 존재를 깨닫고 그 안에서 현명하게 살아가는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일지 모른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소년 싱클레어는 극심한 혼란과 두려움을 겪는다. 자신에게 허용된 밝은 세계에서 차츰 벗어나면서 내면의 목소리를 제대로 따르지 못해서였다.
피스토리우스는 “아무것도 무서워해선 안 되고 영혼이 우리들 마음속에서 소망하는 그 무엇도 금지되었다고 해서는 안 되지”라고 말한다. 아브락사스의 날갯짓을 선의 잣대로 판단하지 말란 뜻이다. 세간의 도덕적 시각을 따르느라 좋은 뜻으로 품은 생각을 미리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이다.
피스토리우스는 “우리가 우리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 않은 현실이란 없다”고 한다. 어쩌면 혐오의 감정도 비슷하다. 혐오의 대상이 되는 존재가 악이라서가 아니라 그 대상에게서 느껴지는 나의 모습 때문에 나오는 감정일 가능성이 높다. 혐오는 내면의 발현과 가까울 수 있다.
데미안은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는 구절로 유명하다. 환한 세계의 것만이 세상의 전부이자 모두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아니라는 점을 말한다. “내면에 더 귀 기울이라”는 메시지가 구구절절 묻어난다. 지나치게 상징적인 언어, 성경과 결합한 이야기 때문에 익숙지 않은 이에겐 다소 난해한 부분도 있다. 그렇더라도 인생에서 갈등과 방황을 느끼고 있다면 읽어볼 만한 소설이다.
책속의 이 한줄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고양이 눈
구독
-

사설
구독
-

오늘과 내일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책속의 이 한줄]위기는 남이 아닌 자기 자신이 만든다](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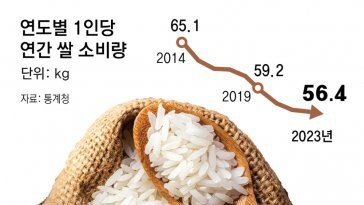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