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투 더 동아/1월 17일]

16일 600만 관중을 돌파한 영화 ‘1987’에는 물 고문을 받다 숨진 고(故) 박종철 열사의 유해를 아버지와 형이 강물 위에 뿌리는 장면이 나온다. 이 영화를 본 전국의 많은 아버지들이 “이 장면에서 가장 가슴이 아팠다”고 했다.

1987년 오늘(1월 17일)자 동아일보 창(窓) ‘이 아비는 아무 할 말이 없다이’는 실제 이날 현장을 독자에게 소개했다. 당시 이 기사를 쓴 황열헌 기자는 현재 정세균 국회의장 비서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아래는 당시 기사 원문.
《15일 오후 6시경 서울 중구 황학동 경찰병원 영안실. 치안본부 대공수사2단에서 교내 시위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다 숨진 서울대생 박종철 군(21·언어학과 3년)의 분향실이 마련된 이곳의 경비는 삼엄하기 짝이 없었다.
“13일 밤 철이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하숙비를 좀 보내달라고…. 그런데 집에는 돈이 한 푼도 없었거든요…” 박 양은 목이 메어 잠시 말을 끊었다.
“그런데… 14일 저녁 낯선 남자가 찾아와 아부지를 데리고 상경한 뒤 오늘 아침 아부지한테서 염불 책과 철이 사진을 가져오라는 전화가 왔잖아요.” 박 군의 누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이때 아버지 박정기 씨(57)가 실성한 모습으로 분향실 안으로 들어왔다.
“뭐요. 뭘 알고 싶소. 우리 자식이 못 돼서 죽었소.” 박 씨는 내뱉듯 외쳤다.
16일 오전 8시 25분 박 군의 사체는 영안실을 떠나 벽제화장장으로 옮겨져 오전 9시 10분 화장됐다.
두 시간여 화장이 계속되는 동안 아버지 박 씨는 박 군의 영정 앞에서 정신 나간 듯 혼잣말을 계속했고 어머니 정차순 씨(54)는 실신, 병원으로 옮겨졌다.
화장이 끝난 박 군의 유골은 분골실로 옮겨졌고 잠시 뒤 하얀 잿가루로 변해 박 군의 형 종부 씨(29)의 가슴에 안겨졌다.
종부 씨는 아무 말 없이 박 군의 유해를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경찰이 마련한 검은색 승용차에 올랐다. 잠시 후 일행은 화장장 근처의 임진강 지류에 도착했다.
“철아, 잘 가그래이…” 아버지 박 씨는 가슴 속에서 쥐어짜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박 씨는 끝으로 흰 종이를 강물 위에 띄우며 “철아, 잘 가그래이. 이 아부지는 아무 할 말이 없다이”라고 통곡을 삼키며 허공을 향해 외쳤다. 이를 지켜보는 주위 사람들은 흐느끼거나 눈시울을 붉혔다.
박 군의 유골 가루를 뿌린 후 박 군의 아버지를 태운 승용차는 경찰병원에 들러 박 군의 부검을 지켜본 삼촌 월길 씨를 태우고 시내를 한동안 헤맨 뒤 치안본부 대공분실 마당 안으로 사라졌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백 투 더 동아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오늘의 운세
구독
-

딥다이브
구독
-

이철희 칼럼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백 투 더 동아/1월 17일]‘이 아비는 아무 할 말이 없다이’…잊을 수 없는 1987년의 기억](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8/01/17/88204030.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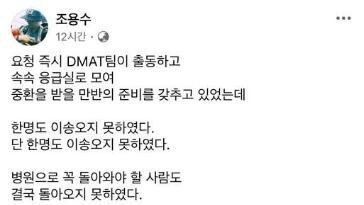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