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느님 이 아이를 도우소서/토니 모리슨 지음/정영목 옮김/248쪽·1만3500원/문학동네
피부가 너무 검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돌봄받지 못한 소녀
유일하게 의지하던 남자친구 갑자기 떠나며 삶 뒤흔들려
노벨문학상 수상한 흑인 소설가, 응원하듯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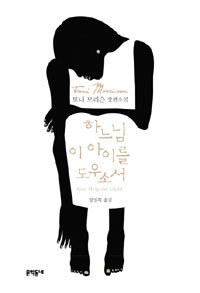
1990년대, 타르처럼 짙은 검은색 피부를 가진 소녀 룰라 앤은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싸늘한 시선을 받는다. 흑인 치고는 피부색이 밝은 어머니는 ‘엄마’라는 호칭 대신 ‘스위트니스’라고 부르게 하고 목욕을 시킬 때조차 딸의 몸에 손을 대지 않으려 한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외도를 했다고 의심하며 떠나버린다. 소녀는 어머니의 손결을 느끼고 싶어 차라리 때려주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어머니는 초경을 시작한 딸이 침대 시트를 얼룩지게 만들자 따귀를 때리고 냉수가 가득한 욕조로 밀어 넣는다. 소녀는 충격 속에서도 어머니가 자신을 만졌다는 사실에 만족감을 느낄 정도다.
소녀가 어른이 되자 짙은 검은색 피부는 강렬한 매력으로 인식되며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다. 이름도 ‘브라이드’로 바꿨다. 화장품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주요 브랜드를 총지휘하는 임원이 됐다. 남자친구 부커와는 서로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는 쿨한 관계다.
브라이드, 스위트니스, 부커 등의 1인칭 시점이 교차하며 이야기는 속도감 있게 전개된다. 브라이드와 부커의 과거가 차례로 드러나며 의문의 베일이 한 겹씩 벗겨진다. 피해만 입고 살았을 것 같은 브라이드가 한 사람(백인이다)의 삶을 짓이긴 가해자였다는 사실도 밝혀진다.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도 될 수 있는 양면적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백인 소년들이 노는 곳을 가로질러갔다는 이유만으로 흑인 소녀가 집단 구타를 당하고 백인 부모를 위협하기 위해 브라이드를 여자 친구로 소개하는 의대생 등 피부색에 따른 차별이 사라지지 않는 현실도 꼬집는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과 살인이 등장하고, 상처를 다루지만 소설의 분위기는 어둡지 않다. 당돌하고 때로 엉뚱한 브라이드를 보노라면 웃음이 나오기도 한다. 브라이드가 상처를 끄집어내 정면으로 응시하기 시작하자 음모와 겨드랑이 털은 물론 풍성했던 가슴이 완전히 사라지며 소녀의 몸이 되고, 이를 치유한 후 어른의 몸으로 돌아오는 설정은 우화적이다. 저자는 영원히 아물지 않을 것 같은 상처에도 딱지가 앉게 하는 방법은 있다고 속삭이는 듯하다. 아픈 이야기를 들어주고, 어깨를 토닥여주며 일어설 힘을 주는 존재는 그리 멀리 있지 않다고. 상처의 진물은 그렇게 닦아내는 것이리라. 원제는 ‘God Help The Child’.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박중현 칼럼]‘개혁 주체’에서 ‘개혁의 적’으로 바뀐 尹의 운명](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667355.1.thumb.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