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H.M/루크 디트리치 지음·김한영 옮김/546쪽·2만6800원·동녘사이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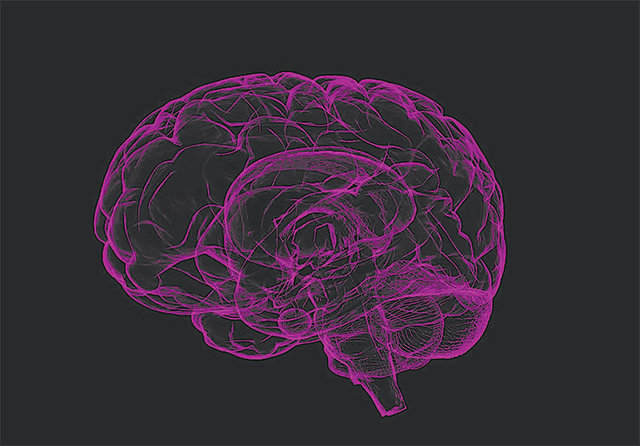

이름만 들으면 낯설다. 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낯선 존재가 아니다.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영화 ‘메멘토’의 실존모델이자 신경과학 역사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유명 환자이기 때문이다. 그는 생전에 이름 대신 ‘환자 H.M’으로 불렸다.
헨리 몰래슨을 ‘환자 H.M’으로 역사에 남게 한 것은 치명적인 의료 사고였다. 중증 간질로 고생하던 공장노동자 헨리는 1953년 뇌 절제술을 받는다.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를 품고 수술대 위에 눕지만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뀐다. 집도의 스코빌 박사는 뇌의 어떤 부분이 간질을 초래하는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내측 측두엽 구조물을 모두 제거해버린다. 불확실한 수술이 초래할지 모를 부작용을 무시하고 감행한 그 수술은 요양원에서 진전 없는 뇌 연구나 하고 있던 그를 일약 세계적 뇌과학 권위자로 만들어준다. 헨리 몰래슨의 사망이자, 환자 H.M의 탄생이었다.
헨리가 수술 부작용으로 겪어야 한 대가는 혹독했다. 그는 장기기억을 형성하는 능력을 잃는 기억상실증을 앓게 된다. 항상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몽롱한 상태로, 삶에 드나드는 끝없이 낯선 사람에 둘러싸여 살아야 했다. 아버지의 사망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해 메모로 적어 셔츠에 넣고 다녔다.
동시에 그는 평생 장단기 기억, 꿈, 관성, 통증내성 등 셀 수 없이 많은 실험의 대상이 됐다. 뇌의 일부를 상실해 이상 반응이 생긴 그는 뇌 과학 연구에 더없이 적합했기 때문이다. 연구자들은 헨리를 대상으로 한 실험으로 명성을 얻었고 정부와 민간의 지원금을 타냈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의 수전 코긴 박사는 그의 가치가 무한하다는 걸 깨닫고 ‘소유권’을 독점하기까지 한다. 그 과정에서 헨리는 마치 애완동물처럼 취급됐고 그의 인간적 아픔은 기록에서 지워졌다. 그는 임상사례 ‘환자 H.M’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죽어서까지도 헨리의 뇌 소유권을 놓고 MIT와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UCSD) 등 대학들은 다툼을 벌인다. 그의 뇌는 연구자들에게 “트로피이자 귀중한 유물”이었기 때문이다. 50년간 헨리를 알아온 코긴 박사는 그가 죽자 바로 뇌 적출 부검을 감행한 뒤 그 순간을 “황홀했다”고 회상한다. 그들에게 헨리는 그저 데이터를 공급해줄 원천일 뿐이었다.
1985년 시카고대 화학자 에드윈 슬로슨은 ‘생명과 앎의 상대적 가치’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에드워드 제너가 천연두 백신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정원사의 고작 여덟 살 된 아들에게 균을 주입하는 실험을 했던 것처럼, 극단적인 공리주의 발상은 과학의 역사 속에 암암리에 흘러온 어두운 전통이다. 저자는 6년에 걸친 취재 끝에 시공간을 오가며 헨리의 삶을 다각도에서 소설처럼 추적했다. 비윤리적 실험까지도 정당화해가며 발전을 거듭해온 과학역사의 어두운 이면이 퍼즐 맞추기처럼 찬찬히 들춰진다.
박선희 기자 teller@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박중현 칼럼]‘개혁 주체’에서 ‘개혁의 적’으로 바뀐 尹의 운명](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667355.1.thumb.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