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국에 제 영화를 보여드리고, 관객들이 따뜻하게 맞이해주신 경험 자체가 굉장히 특별합니다. 제게 많은 감정과 감동을 불러일으킨 경험입니다.”
영화 전체를 컴퓨터 스크린으로 구성한 독특한 형식으로 인기를 끈 ‘서치’의 주연배우 존 조(46)가 한국을 찾았다. 16일 서울 종로구 한 호텔에서 만난 그는 “특별히 한국 관객에게 감사를 드려야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가 공식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것은 2009년 ‘스타트렉:더 비기닝’ 이후 9년 만. 이번 방한은 가족과 함께 내한해 친척들과 경기 파주시를 찾기도 했다. 인스타그램에 할머니 댁 감나무 사진을 올리거나,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상 옆에서 셀카도 찍어 올렸다. 조는 “어릴 때 우리나라가 글자를 만들었다는 게 너무 멋지다고 생각했다”며 “한국에서 시간을 보낸 지 오래돼 많은 게 제 기억과 달라졌지만, 익숙한 모습도 있어 반가웠다”고 말했다.
조는 ‘서치’에서 행방불명된 딸을 찾기 위해 온라인을 샅샅이 뒤지는 아버지 역할을 맡았다. 그는 처음엔 이 독특한 연출 방식 탓에 출연을 꺼렸다고 털어놨다.

그런 그가 마음을 움직인 건 진정성 있는 영화를 만들겠다는 감독의 비전이었다.
한국에서의 인기 비결에 대해선 ‘모르겠다’고 하더니, 조심스럽게 “관객의 이해도가 높은 것 같다”고 했다.
“한국이 워낙 IT 강국이라 미국에 비해 디지털 기기나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가 빠른 것 같았습니다. 또 한국계 미국인 가정이 주인공으로 극을 이끌어 나가서 더 친숙하게 다가가지 않았을까요?”
조는 한국영화도 많이 보는 편이다. 최근 감명 깊게 본 작품으로 ‘버닝’과 ‘리틀 포레스트’를 꼽았다. 그는 “버닝은 굉장히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영화라고 생각했다. 두 영화가 굉장히 다르지만, 긴밀하게 연결된 사회에서 우리가 얼마나 외로운지를 보여줘서 굉장히 감명 깊었다”고 했다.
한국에서 태어나 6살 때 가족과 이민간 조는 ‘아메리칸 파이’ ‘아메리칸 뷰티’ 등에서 단역으로 시작해 코미디영화 ‘해롤드와 쿠마’에서 주인공 역을 맡으며 이름을 알렸다. 이후 두터운 마니아층을 가진 SF영화 ‘스타트렉’ 리부트 시리즈에서 ‘술루’ 역을 맡아 글로벌 배우로 발돋움했다. 2006년에는 피플 지가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남자’로 선정하기도 했다.
김민 기자kimmin@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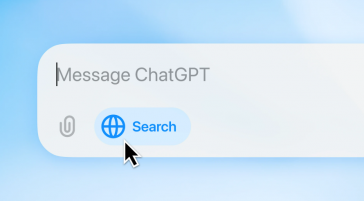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