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청년 작가들]<17>문학으로 새 삶, 소설가 김혜나

김혜나 소설가(36)가 최근 낸 소설집 ‘청귤’(은행나무·1만2000원)에는 이런 인물이 있다. 지각, 조퇴, 결석을 반복하고 자꾸만 가출하는 여학생이다.
“학교에선 상담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어요. 반성문 쓰느라고. 가끔씩 들어가는 수업 땐 잠만 잤고요. 성적은 최악, 수없이 정학 맞고.”
그가 22일 들려준 학창시절 얘기는 소설의 주인공과 겹쳐진다. ‘그러다 정신 차리고 공부해서 명문대에 합격했다’면 감동적인 합격 수기감이었겠지만, 방황하던 청소년기를 보내고 맞은 20대는 더욱 암담했다. 낮에는 카페나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사람들과 어울려 취하도록 술을 마시면서 시간을 보냈다.
동네(서울 양천구 목동)에선 공부를 열심히 하던 학생들이 다수여서, 친구를 제대로 사귀지 못해 책만 파고들었던 그였다. 소설가가 되겠다고 마음먹고 습작에 들어갔고, 소설이 ‘20대를 고스란히 집어삼킨’ 7년 뒤에야 등단했다.
‘청귤’의 미영은 룸살롱 사장의 아내이고 욕을 달고 산다. 그의 친구 지영은 ‘선생님’ 소리를 듣는 작가이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헬스장 안내원이라는 부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지영에게는 요가 강사로도 활동하는 김 씨의 생활이, 미영에게는 고교 졸업 뒤 함께 부대끼며 시간을 보냈던 술친구들의 삶이 녹아 있어 묘사가 생생하다. 김 씨는 “두 사람은 타인인 동시에 자기일 수 있다. 자신을 비추는 거울처럼, 서로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설을 읽는 건 거울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거울로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비춰 보는 거죠. 살면서 억울했던 것, 마음 아팠던 것, 차마 말할 수 없었던 것…. 그런 속내들을 소설이 보여줍니다.”
그는 “지난 세기의 문인들은 전쟁을 겪었기에 자신의 체험을 쓰는 게 그대로 시대의 고민을 담은 소설이 됐지만, 새로운 세기에는 거대한 외적 갈등이 사라진 대신 많은 이들이 자신의 일에 관심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모두가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자신을 바꿀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톨스토이의 말을 들려주면서 김 씨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시대이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매개체가 문학”이라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kimjy@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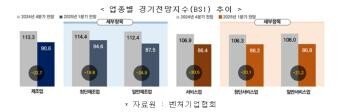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