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기가 언제쯤 스스로 뒤집더라?”
퇴근한 남편이 누워서 버둥대는 막내를 보며 물었다. 아이 넷 아빠가 그것도 몰라? 아니 가만… 4개월 때였나? 5개월인가? 아니다, 이유식 먹을 때 지나면 뒤집던가? “글쎄, 나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흔히들 아이 넷 부모라고 하면 ‘걸어 다니는 임신·육아 백과사전’일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지 않은가. 불과 몇 년 지났다고 기본적인 발달과정조차 가물가물하다. 평범하게 키웠다면 어련히 겪었을 것들―배밀이, 기어가기를 시작하는 시기나 월령별 수면시간, 수유량 같은 것들―이 벌써부터 까마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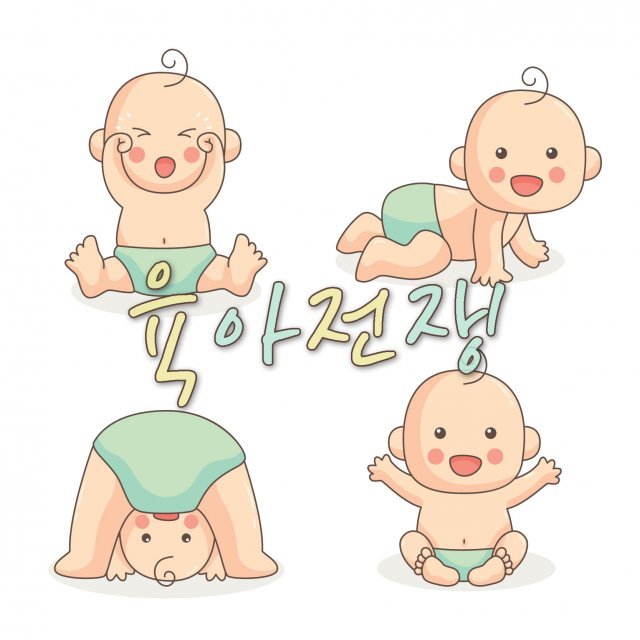
어르기도 하고, 강제로 물려도 보고, 한참 배를 곯려 보기도 했다. 6년여의 육아노하우를 모두 적용해봤지만 먹히질 않았다. 결국 최후의 방법으로 맘(mom)카페에 질문을 올렸다. ‘모유를 잘 먹던 아가가 갑자기 젖만 보면 우는데 왜 그럴까요?’ 글을 쓰며 스스로도 황당함에 웃음이 나왔다. 아이 넷을 키웠다는 엄마가 다른 부모들의 조언을 구하고 있다니….
하긴, 아무리 내 새끼라도 가끔 정말 같은 배에서 나온 게 맞을까 싶을 정도로 다르니 나라고 별 수 있나. 첫째에게 통한 방법이 동생들에게 통하지 않고, 그 반대일 때도 부지기수다. ‘이것만은 진리!’라고 믿었던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도 많다.
한데 넷째를 낳고나서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 셋째가 다시 밤에 오줌을 지리기 시작한 것이다. 몇 달간 스스로 잘 일어나 화장실에서 소변을 잘 보던 아이가 언제부턴가 도로 이불에 쉬를 했다. “나 다시 기저귀 찰래!” 하며 떼를 쓰기로 했다.
말로만 듣던 ‘퇴행행동’이었다. 시기도 그렇고, 기저귀를 차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것을 볼 때 보나마나 동생이 생긴 데 따른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다. 앞서 두 아이도 있었지만 정작 퇴행은 처음 경험해보는 터라 당황스러웠다. 첫째 둘째가 잘 지나갔기에 그저 ‘우리 애들은 동생앓이가 없나보다’라고만 생각했다.
나는 육아서적에 나오듯 셋째에게 더 관심을 보이고 사랑을 주려 애썼다. 좋은 말로 타일렀고 쉬를 하지 않은 날 아침에는 사탕이라는 ‘인센티브’를 주기도 했다. 그럼에도 실수가 계속되자 지친 마음에 아이를 무섭게 혼내봤다. 그 옛날 키를 쓰고 동네를 돌 듯 “복도를 돌게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그래도 오줌 지리기는 현재진행형이다. 첫째, 둘째 때도 찾아보지 않았던 ‘밤 기저귀 떼는 법’을 셋째에 이르러 수소문하게 될 줄이야. 육아의 세계는 정말 끝이 없다.

그런데 웬 걸,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둘째가 “모범적이고 사교적인 아이라 반에서 ‘반장’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이었다. 부모에게 웬만해선 아이 칭찬을 하겠지만 그런 점을 감안해도 ‘사교적인 아이’라니 무척 의외였다. 이후 둘째를 가만히 지켜보니 고집은 셀지언정 정말 친구들 사이에서 밝고 적극적인 모습이었다. 내가 알던 모습은 아이의 반쪽에 불과했다.
키우면 키울수록 아이들은 각기 다른 우주 같다는 느낌이다. 얼핏 나선형, 타원형으로 비슷해 보이는 은하도 실은 그 안에 수천만 개의 다른 별들을 품고 있듯이 말이다. 비슷해 보이는 아이들도 그 안에 전혀 다른 별과 성운과 블랙홀을 품고 있는 것 같다. 아직 그 중 반의 반도 탐험하지 못했다. 넷째에 대해선 여전히 초보 엄마다. 엄마는 영원한 여정인가보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포(four)에버육아]나에게 당연한 것과 남편에게 당연한 것…누구에게나 공평한 육아의 무게](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8/12/18/93360111.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