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동전’의 작자는 허균이 아니다/이윤석 지음/272쪽·한뼘책방·1만4000원

“‘홍길동전’ 저자는 허균. 최초의 국문 소설. 주제는 적서 차별 타파.”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모두가 그렇게 외웠기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로 받아들여왔다. 하지만 팩트 체크의 잣대를 들이대면 의뭉스러운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첫째, 허균(1569∼1618)은 16세기의 인물인데 ‘홍길동전’에는 17세기 후반의 인물인 장길산이 등장한다. 둘째, 소설에 등장하는 선혜청은 18세기에 들어서야 활성화된 관청이다. 셋째, ‘홍길동전’을 제외한 모든 한글 소설은 18세기 후반부터 등장한다. 따라서 허균은 ‘홍길동전’의 저자라고 볼 수 없다. 그가 시간 여행자였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말이다.
비운의 천재 개혁가가 쓴 책이라는 프레임은 올바른 독해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동해 왔다. ‘홍길동전’은 이름 없는 서민 작가가 천대받던 한글로 적서차별의 문제를 꼬집은 작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서민의 정서와 생활상을 보여주는 귀중한 사료다. 책 후반부에 가면 현전하는 30여 종의 ‘홍길동전’을 종합해 복원된 ‘홍길동전’이 수록돼 있는데, 이 또한 일독의 가치가 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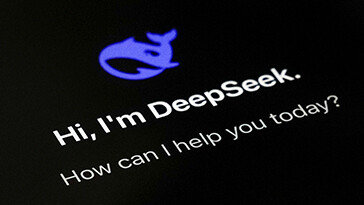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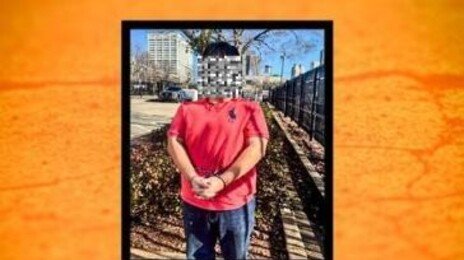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