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유병자들/크리스토퍼 클라크 지음·이재만 옮김/1016쪽·4만8000원·책과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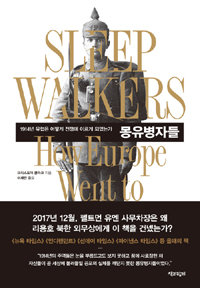
올해는 제1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한 베르사유 조약 체결 100주년을 맞는 해. 이 전쟁의 기원을 읽는 시선들은 대부분 ‘독일의 호전성’에 초점을 맞춰 왔다. 유럽과 세계의 지배자로 군림하려는 독일 빌헬름 2세 황제의 야망이 파국을 불러왔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저자는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대신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 일어났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그 결론은 특정 당사자의 책임론을 비켜간다. 전쟁은 불가피한 귀결이 아니라 수많은 결정들의 연쇄적인 결과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충분히 상황을 바꿀 수도 있었다.
연구의 대부분은 1914년 6월 28일, 보스니아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황위 계승자가 테러리스트의 총탄에 암살되면서부터 8월 초 열강들 사이에 선전포고가 연쇄 폭발하기까지 한 달 남짓 이어진 각국 권부와 군부, 외교가 핵심부의 움직임을 파헤친다. 그 전사(前史)는 세르비아 대민족주의를 촉발한 1903년 베오그라드 정변으로 시작된다. 이어 유럽 열강들의 손잡기가 1907년 러시아-프랑스-영국, 독일-오스트리아의 동맹으로 귀결되면서 대충돌의 필연적인 조건이 조성되고, 총성이 터진다.
황위 계승자를 잃었지만 오스트리아는 일을 키울 생각이 없었다. 선전포고 없이 베오그라드를 타격했다면 다른 나라들이 양해할 수도 있었지만 기회를 놓쳤다. 세르비아에 최후통첩을 보낸다는 결정은 사전에 누설됐고, 러시아의 강경책을 불러왔다.
러시아 역시 일을 키울 맘은 없었다. 동원령을 내렸지만 강력한 경고 정도로만 생각했다. 독일도 마찬가지였다. 빌헬름 2세는 오스트리아 황제에게 세르비아가 양보할 거라고 장담했다. 그는 호전적이기는커녕 분쟁이 임박할 때마다 몸을 사리는 군주였다. 프랑스와 영국도 결정자들의 우유부단과 눈치 보기는 똑같았다.
그런 한편으로 나라 사이의 협상에 있어서 과단성의 부족과 과잉, 동맹에의 과신, 여론에 끌려다니기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는 100년 전과 오늘이 다르지 않다. 세계 전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장벽과 고립과 적대감이 늘어나는 이 시대에 대해 미래의 역사가가 ‘당시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었다. 파국은 피할 수 있었다’고 말하게 되지는 않을까.
“1914년에 정치인들이 얻고자 다툰 상(賞) 가운데 그 무엇도 뒤이은 대재앙을 감수할 만큼 가치 있지 않았다. 1914년의 주역들은 꿈에 사로잡힌 채 자신들이 불러들일 공포의 실체를 깨닫지 못한 몽유병자(sleepwalker)들이었다.”
유윤종 기자 gustav@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대통령을 뽑았더니 영부남?” 활동 중단 김여사의 향후 행보는? [황형준의 법정모독]](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476280.1.thumb.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