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은 어떻게 전염되는가/리 대니얼 크라비츠 지음·조영학 옮김/280쪽·1만6000원·동아시아


이 책, 띠지가 영 그렇다. ‘미국판 스카이캐슬’이란 문구는 별로다. 화제작을 언급하면 관심을 좀 더 끌긴 하겠지. 한데 ‘감정은 어떻게 전염되는가’는 드라마와 전혀 결이 다르다.
물론 엇비슷한 상황이긴 하다. 200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팰로앨토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다. 실리콘밸리가 있는 그 부촌 말이다. 그곳 명문인 헨리 건(Henry M Gunn) 고등학교 학생들이 연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것도 다섯 명이나 기차에 몸을 던져서.
개념은 그리 어렵지 않다.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전염되면서 타인이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일컫는다. 보통 전염이라 하면 다소 부정적 뉘앙스가 있는데, 사회전염은 가치중립적이다. 임상역학자 게리 슬럿킨은 이를 ‘좋다’ ‘나쁘다’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우리가 할 일은 사회전염은 물론 전염의 힘이 미치는 곳까지 철저히 파헤쳐 사회 안녕에 이바지하는 것뿐이다.”

이 책은 바로 이 대목에서 큰 매력을 지녔다. 단순히 형식적인 대안 찾기에 그치지 않는다. 정부 정책이나 사회운동 등 다양한 방면에서 실효성을 따진다. 저자는 이게 정답이라 확언하진 않지만 ‘공동체’에서 돌파구를 찾는다. “택시 운전사에서 바리스타까지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훈련을 받고 사회전염의 ‘단속단’이 되고 징후를 감시하고 필요한 자원을 어떻게 확보할지 알아야만” 이런 참극은 예방과 대처가 가능하다고 본다. 저자는 이런 결론을 오랫동안 공들여 현장을 취재하며 설득력 있게 풀어냈다.
정양환 기자 ray@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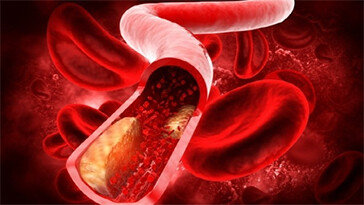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