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의 도전/김도현 지음/424쪽·2만2000원·오월의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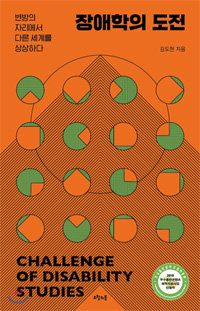
“민족공동체가 이 유전병 환자에게 일생 동안 써야 하는 돈이 6만 마르크다. 국민 동지여. 이 돈은 그대의 돈이기도 하다.”
과거 독일 나치는 장애인이 국가의 경제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여겼다. 선천성 질환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국가가 세금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건강한 일가족의 하루 생활비라고 구구절절 설명하는 선전물까지 배포했다. 지금 보면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얘기라 생각하겠지만, 불과 약 90년 전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발상이다. 그리고 이 같은 차별논리는 지금도 우리 사회 속에 교묘히 파고들어 있다.
장애인 운동에 앞장서 온 김도현 노들장애학궁리소 연구활동가가 인간 사회 내 뿌리박힌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협한 사고를 지적했다. 저자는 복지재단 비리에 반발해 청각장애인들이 직접 농성을 벌인 1996년 ‘에바다복지회’ 사태 때부터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당신은 장애를 아는가’ ‘장애학 함께 읽기’ 등 전작에 이어 비(非)장애인 중심 사회의 단면을 조목조목 짚는다. 특히 본인이 직접 현장에서 겪은 경험과 느낀 바를 얘기하듯 풀어내며 “장애인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차별받기 때문에 장애인이 된다”고 일갈한다.
또한 저자는 ‘모든 사람은 예비 장애인’이라는 식의 논리도 오히려 장애 차별의 본질을 흐린다고 봤다. 본질은 차별받는 대상이 아니라 이를 차별하는 사회의 문제라는 것. 나아가 “장애인은 자립적 존재라고 맞서는 대신, 자립과 의존이란 이분법 자체를 깨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김순덕의 도발]‘이재명 리스크’ 민주당은 몰랐단 말인가](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439561.1.thumb.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