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팩토리/조슈아 B 프리먼 지음·이경남 옮김/512쪽·2만6000원·시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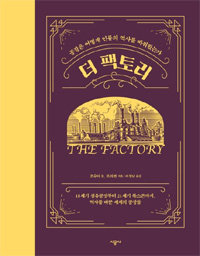
세계 경제가 4차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지만 세계에서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율은 2010년 29%로 1994년의 22%보다 오히려 늘었다. 폐허가 된 공장지대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외친 사람은 미국 대통령이 됐다. 지금도 ‘굴뚝’의 상실은 치명적인 사회적 상실이다.
거대 공장, ‘팩토리’는 점진적인 발전의 결과가 아니었다. 1721년 영국 더비에 5층짜리 실크 공장이 들어서면서 공장의 역사는 한순간에 도약했다. 실크 공장 모델이 면직공업에 적용돼 산업혁명의 원동력을 낳았고 현대 공장 시스템의 원형이 됐다. 대형 공장은 장점이 컸다. 여러 공정을 쉽게 조정할 수 있었고 품질이 확실해졌다. 공장의 발달이 사회의 변화도 가져왔다. 고요하던 전원의 지역사회가 공장을 중심으로 재편됐다. 그러나 어린이까지 포함한 노동자들의 삶은 ‘자주’ 말이 아니었다. 마르크스주의의 탄생도 공장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 공장의 강력한 근대성이 가장 어울리는 곳은 신대륙이었다. 미국인들은 기계와 대량생산을 국가의 핵심 요소로 간주했다. 1913년 헨리 포드가 컨베이어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공장은 그 자체로 거대한 하나의 기계가 됐다. 단순 노동에 질린 근로자들이 이직 행렬을 이뤘지만 포드는 임금을 올려 이들을 붙잡았다. 근로복지나 노동조합처럼 현대사회를 이루는 개념들이 공장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대형 공장은 의외로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장소이기도 했다. 마르크스주의자를 자처했던 멕시코 화가 디에고 리베라도 포드 공장에 매료돼 벽화 ‘디트로이트 산업’으로 인간과 기계의 힘을 찬미했다.
책 말미에 저자의 시선은 세계에서 가장 큰 공장들이 밀집한 곳으로 옮겨간다. 중국의 폭스콘 공장은 왜 그렇게 클까. 이유는 외주 생산 시대가 온 데 있다. 폭스콘은 애플, 델, HP 등 수많은 외국 유명 기업들의 제품과 부품을 생산한다. 인터넷과 위성통신의 발달로 지리적 거리가 의미를 잃은 결과다. 그러나 이 같은 경향도 최종 모델이 될 수는 없다. 이미 중국보다 임금이 낮은 곳에서, 더 작고 더 자동화된 공장을 짓는 물결이 시작됐다고 저자는 진단한다.
이 책은 공장이라는 실물과 제도를 넘어 그 사회적 파생물과 영향들을 두루 짚어냈다. 시야가 확장되는 쾌감을 준다. 논리적 비약이나 섣부른 예언은 최대한 덜어냈다.
유윤종 문화전문기자 gustav@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노안-난청, 잘 관리하면 늦출 수 있다[건강수명 UP!]](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484349.15.thumb.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