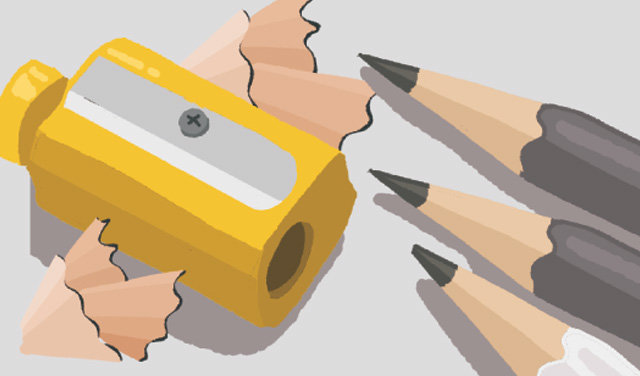

살까 말까. 고민을 거듭했고, 사더라도 내가 갖기보다는 누군가에게 건네는 게 좋겠단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연필심 굵기를 3단으로 조절할 수 있는 황동 연필깎이라면 죽을 때까지 쓸 수 있진 않을까, 하면서 결론을 뒤집고 또 뒤집었다. 칼(날)의 역사를 논할 때 독일은 늘 첫 번째라는 걸 알고 있던 바였다. 거기에서도 유구한 역사를 자랑한다는 ‘사실’ 때문에 나는 여태 고민 중이다.
연필깎이 고민보다 조금 더 오래전에는 아니 에르노의 글을 몇 개 읽었다. 에르노는 자전소설로 유명한 작가다. 이를테면 낙태하게 된 어떤 날의 이야기부터 사랑이라 할 수 있는 뜨거운 순간들까지…. 깊숙한 곳에 서식하는 기억이 오늘에 와서는 물성이 있는 물건처럼 선명하게 복원된다. 단숨에 읽게 되는 것과는 달리 책을 덮고 난 다음에도 그녀는 자주 말을 걸었다. 인상 깊게 본 건 ‘사건’이었다. ‘사건’에는 젊은 날 겪은 낙태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거의 그것뿐이다. 낙태까지의 지난하고 험난한 이야기. 어떤 문장을 여러 번 곱씹기도 했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혐오감을 자극할 수도 있을 테고, 불쾌감을 불러일으켜 비난을 살지도 모르겠다. 어떤 일이든 간에 무엇을 경험했다는 사실은, 그 일을 쓸 수 있다는 절대적인 권리를 부여한다. 저급한 진실이란 없다.”
에르노의 건강하고 믿음직한 포옹 앞에서, 그러니까 나는 조금 작아지고 말았다. 어떤 고백은 단순히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진실로 승화된다는 걸 모르진 않았지만, 나아가 “진실은 저급하지 않다”고 말하는 에르노를 힘껏 껴안고 싶었다. 쓰면 쓸수록 짧아지는 연필을, 다시금 뾰족하게 심을 세우는 일을 에르노와 함께 엮고 싶었던 건 그래서인지도 모른다. 스스로 껴안기 위해서 에르노는 직시한다. 과연 나는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일까. 베란다 밖으론 목련이 가득 피었고, 그것은 빛나고 있다. 생각해보면 어렴풋이 피는 꽃 같은 건 없었다.
김동균 2020년 신춘문예 시 당선자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첫 마음, 첫 발자국]눈물의 맛](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0/03/30/100404740.1.jpg)

![[횡설수설/신광영]100세로 눈감은 카터, 퇴임 후 더 빛났던 40년](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759280.1.thumb.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