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년 8월 10일
플래시백
‘본 건 공소는 차를 수리치 아니함.’1920년 8월 9일 경성지방법원 특별법정에서 다치카와 지로 재판장이 내린 판결입니다. 손병희 천도교 교주를 비롯한 독립운동가 48인의 재판을 맡을 수 없다는 선언이었죠. 3·1운동을 이끈 지도자들을 재판할 수 없다는 결론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독립운동 지도자들을 처벌하려던 일제의 계획이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치카와 재판장이 ‘재판 불가’ 판결을 내린 계기는 약 한 달 전인 7월 중순 변호인 중 한 명인 허헌 변호사가 찾아냈던 이 사건 예심결정서의 허점이었습니다. 고등법원 특별형사부가 작성한 예심결정서에는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主文)에 ‘경성지방법원을 본 건의 관할재판소로 지정함’이라고만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형사소송법에는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결정할 때는 관할재판소를 ‘지정’하고 ‘송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죠.

검사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결정서 주문에는 사건을 송치한다는 말이 없지만 해설에 해당하는 이유(理由)에는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건은 경성지방법원에서 다룰 수 있다, 만약 재판부가 맡지 않으면 피고들의 고생만 더 길어질 뿐이다, 라고 대응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설마 같은 편인 재판부가 공소불수리 신청을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계산도 했겠죠.
그러나 다치카와 재판장이 내린 결론은 뜻밖에도 ‘재판 불가’였습니다. 8월 10일자 기사 제목 ‘가관할 고등법원의 면목’은 고등법원의 허술한 예심결정서를 꼬집는 표현이었죠. 재판장은 이 재판뿐만 아니라 예심결정서에 똑같은 결함이 있던 창원사건, 신의주사건, 수원사건, 안성사건 등 경성지방법원으로 배정된 3·1운동 관련 재판도 모두 마찬가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치카와 재판장은 ‘재판 불가’ 판결문을 2시간가량 읽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법리가 잔뜩 들어간 내용이어서 적지 않은 방청객들이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이 판결문은 정말 이해하기 힘들지만 검사의 이의제기를 반박하는 형식으로 핵심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건 기록을 넘겼으면 된 것 아니냐는 항변에 ‘사건기록을 넘겼다고 재판할 권리까지 넘어온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관할재판소를 지정한 것이 곧 송치했다는 뜻이고 이유에는 송치한다는 말이 있지 않느냐는 주장에는 ‘지정이라는 말 속에 송치한다는 뜻을 포함시킬 수 없고 송치라는 단어는 주문에 들어 있어야 한다’고 단언했죠. 또 △재판을 맡지 않으면 사법절차에 차질이 빚어지고 상급법원의 결정에 항명하는 것이 된다는 지적에는 ‘예심결정서 오류로 빚어진 재판 차질은 지방법원이 책임질 일이 아니며 지방법원은 상급법원의 지시에 따라 판결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물리칩니다.

결국 다치카와 재판장은 한 달 간 고심 끝에 ‘정치적 판결’이 아니라 ‘법률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는 동아일보 기자가 찾아가 ‘공소불수리 판결로 조선사람 사이에서 유명해졌다’고 하자 ‘법률은 절대적으로 신성하다’고 당당하게 답변했습니다.
이진 기자 leej@donga.com
과거 기사의 원문과 현대문은 '동아플래시100' 사이트(https://www.donga.com/news/donga100)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동아플래시100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글로벌 현장을 가다
구독
-

사설
구독
-

우리 동네 응급실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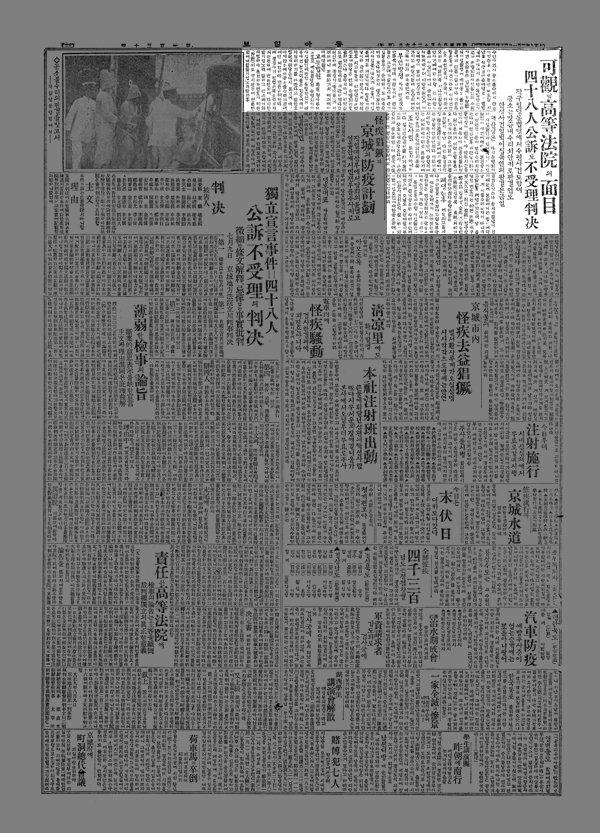
![[동아플래시100]‘63세 러시아 항일투사 최재형’ 일제는 재판도 없이…](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0/05/15/101056418.1.jpg)


![[박중현 칼럼]‘덜 하기’에서 ‘더 하기’로…풍향 바뀌는 ‘일자리’ 시대정신](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461822.1.thumb.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