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1년 2월 21일
플래시백
‘동아일보는 보도가 털끝만큼도 달라진 흔적이 없다.’일제 총독부는 1920년 9월 25일 동아일보에 무기정간을 때리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날 자 사설에 일본 왕실의 3종 신기를 우상이라고 한 것이 무기정간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죠. 하지만 총독부는 이 문제만을 놓고 분노가 폭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총독부가 내민 정간 이유서에는 동아일보가 왜 눈엣가시였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발행정지 5개월 만에 속간된 이듬해 2월 21일자 1면에 실렸죠.
이유서는 ‘창간 때 일본과 조선 두 민족의 복리증진과 문화발전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했더니 곧 과격한 보도와 논설을 실어 자주 발매금지 처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동아일보는 ‘평양에서 만세소요’를 시작으로 정간 때까지 24건의 압수와 삭제처분을 받았죠. 이때마다 새로 인쇄를 해야 해서 손실이 막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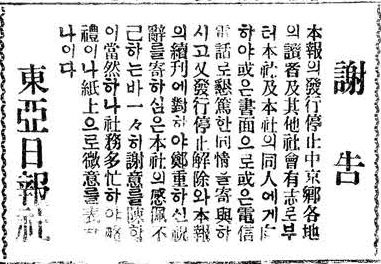
총독부를 향해서도 비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무차별인가 대차별인가(14회)’는 총독부의 민족차별 정책을 거리낌 없이 공격한 시리즈였습니다. 모두 총독부가 ‘독립사상을 선전하고 총독정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보도가 털끝만큼도 달라진 게 없다’고 결론지은 배경이죠.
이렇듯 동아일보는 총독부 권력 앞에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안으로는 신문사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위기를 겪고 있었죠. 무엇보다 돈이 없었습니다. 창간 때 주주들로부터 25만 원을 모으려고 했습니다. 지금의 125억 원에 이르는 금액이었죠.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의 불황에다 국내 가뭄까지 겹쳐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10만 원을 모았으나 그마저도 대부분 인촌 김성수가 채워 넣어야 했죠.

동아일보 직원들도 월급이 제때 나오지 않아 어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정간 때는 견디다 못한 상당수 인쇄공들이 뿔뿔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기자들도 여관 숙식비를 내지 못하거나 하숙에서 쫓겨나 편집국 책상에서 새우잠을 자기 일쑤였죠. 편집감독 유근이 아침 일찍 와서 “여보게들, 어서 일어나 해장국 먹으러 가세”라고 외치는 소리가 반가웠을 겁니다.
총독부는 이런 동아일보에 무기정간을 먹이면 곧 두 손 들겠지 라고 생각했겠죠. 경무국장 마루야마 쓰루키치가 김성수에게 말했습니다. “논조를 건실한 방향으로 고쳐주어야겠소. 그렇게 약속해준다면 내일이라도 정간은 해제될 거요.” 김성수는 “동아일보는 내 개인 것이 아니라 2000만 민중의 신문이어서 내가 여기서 무슨 약속을 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오”라고 대꾸했습니다. 이후에도 동아일보는 1940년 강제 폐간될 때까지 세 차례나 더 무기정간을 당했죠.
뒷날 밀린 숙식비를 갚은 한 동아일보 기자가 여관 주인에게 “그동안 왜 외상 독촉을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나랏일을 보시는데 밥값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라고 대답했죠. 당시 동아일보는 독자와 민족이 함께 만드는 신문이었습니다.
과거 기사의 원문과 현대문은 '동아플래시100' 사이트(https://www.donga.com/news/donga100)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동아플래시100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노후, 어디서 살까
구독
-

Tech&
구독
-

헬스캡슐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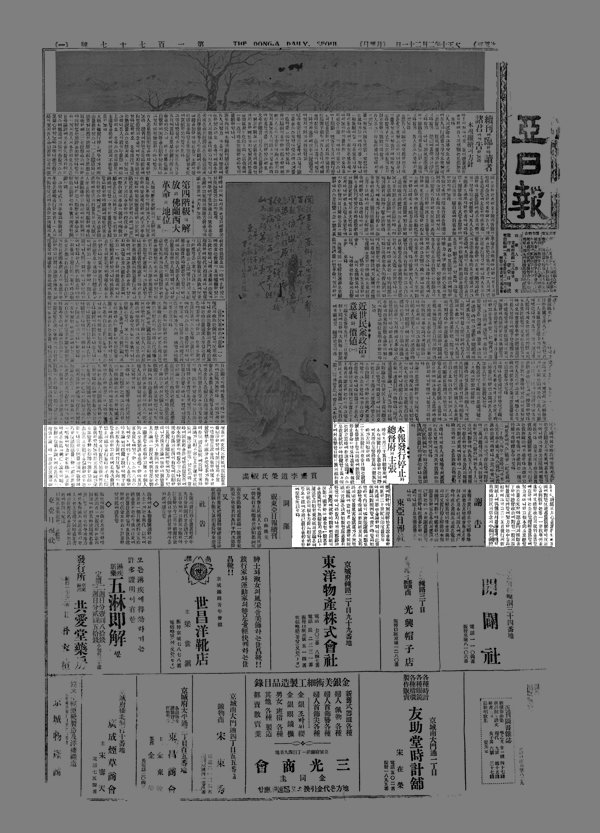
![[동아플래시100]“학살 진실 알릴 것” 어머니 만류에도 떠났던 형, 끝내…](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0/05/30/101281968.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