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튜트 1·2/스티븐 킹 지음 ·이은선 옮김/각 444쪽·1만5000원·황금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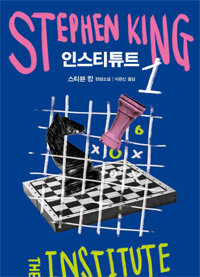
지독하게 운이 나쁜 몇 가지 일이 겹치면서 불명예스럽게 경찰직에서 쫓겨난 팀. 그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뉴욕으로 향하다가 역시나 사소한 우연의 중복과 충동의 연쇄에 따라 아주 한적한 시골 듀프레이에서 야경꾼으로 취직한다. 시골 마을에서 1950년대식 야간 순찰이나 하고 있기엔 성실하고 유능하지만 실직과 이혼을 동시에 겪으며 심란해진 그에게 이 이상하리만치 평온한 마을에서의 삶은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된다. 무더운 여름밤 귀가 찢어진 채 피를 흘리며 횡설수설하는 열두 살 꼬마 루크를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다.
스릴러의 대가 스티븐 킹이 지난해 미국에서 출간한 이 신작 장편소설은 텔레파시와 염력 같은 특별한 능력을 갖춘 아이들을 추적, 관찰하다가 납치해 특수한 목적을 위해 교육하는 비밀 기관에 관한 이야기다. 팀이 외떨어진 마을로 오게 된 사연과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가는 과정을 묘사하면서 감질나게 이야기에 예열을 가하던 작가는 화목하지만 평범한 루크의 가정에 들이닥친 괴한의 습격으로 장면을 전환하면서부터 급박하게 사건을 전개시킨다.
우회 접속 사이트를 통해 자신이 납치되던 날 그의 부모가 피살됐다는 것을 알게 된 데다 실험 약물 부작용으로 입소자들이 죽기까지 하자 루크는 중대 결심을 한다. 이유도 정체도 알 수 없는 이 의문의 기관을 어떻게든 쓰러뜨리고 복수해야겠다는 것.
이제 남은 것은 루크를 중심으로 납치된 아이들이 어떻게 이 기관의 정체와 허점을 파악해서 탈출하고 그들이 처한 상황을 외부에 알리느냐뿐이다.
독자는 루크가 얼마나 영특한 아이인지 알고 있고 초반부에 봤던 믿음직한 야경꾼 팀도 기억한다. 독자는 그 두 사람이 ‘경첩의 사소한 움직임 하나’에 불과한 여러 우연 속에서 상봉할 때쯤 밝혀질 전모를 향해서 신나게 페이지를 넘기면 된다. TMI(너무 많은 정보)이자 약간의 스포일러를 하자면 통제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모든 수단을 정당화하는 이 비밀 기관은 한국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스티븐 킹은 항상 소설만큼이나 ‘작가의 말’이 좋은데, 이번 소설을 착안할 수 있도록 해준 오랜 동료를 추모한 이번 글 역시 그렇다.
박선희 기자 teller@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