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인어블루문’ 14일 마지막 공연
코로나-건물매각 탓 22년만에 폐업
히딩크 단골… 촬영지로도 유명
창업자 “언젠가 다시 문여는 상상”

“개업했을 때 처음 와보고 입이 벌어졌어요. 영화 속 1930, 40년대 미국 뉴욕 클럽 같은 분위기에 황홀했죠. 무대에 오르는 수요일마다 제가 냇 킹 콜이라도 된 기분이었으니까요.”
14일 저녁 서울 강남구 선릉로의 재즈 클럽 ‘원스 인 어 블루문’의 아티스트 대기실. 한국 1세대 재즈 보컬 김준 씨(80)가 ‘블루문’의 히스토리를 회고했다. 엷은 웃음, 젖은 눈으로.
국내 재즈 문화 성지로 자리했던 ‘원스 인 어 블루문’이 이날 공연을 끝으로 22년 세월을 등지고 문을 닫았다. 1998년 4월 개업한 ‘…블루문’은 강남의 문화 랜드마크였다. 영화 ‘가문의 영광’, 드라마 ‘파리의 연인’ ‘내 이름은 김삼순’ 등 영상물 촬영지, VIP 모임 장소, 해외 음악가의 공연 뒤풀이 장소로도 유명했다.
‘…블루문’은 강남의 한 시대를 상징한다. 압구정 ‘오렌지족’ 시대의 끝물,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속에 문을 열었다. 임 사장은 19년의 대기업 생활을 청산하고 이 공간을 임대해 개업했다. 주변의 만류도 안 먹혔다. 학창 시절 꿈을 이룰, ‘지극히 드문 일생일대의 기회(once in a blue moon)’로 봤기 때문이다.
“전화위복이라고 할까요. IMF로 월급이 반 토막 난 특급호텔 셰프, 수요가 떨어진 고급 인테리어 자재를 비교적 수월하게 들일 수 있었죠.”(임 사장)
대기업에서 연마한 홍보·마케팅 수완으로 주한 외국인, 재미교포, 경제적 여유와 문화적 취향이 있는 이들을 공략했다.
2002 한일 월드컵 때는 여느 식당처럼 대형스크린을 설치해 응원전을 했는데, 한국전이 끝난 지 불과 한 시간여 만에 재즈 애호가인 거스 히딩크 전 국가대표 감독이 이곳에 달려와 객석을 뒤집어놓기도 했다.
14일 밤 12시까지 이어진 피날레 무대에는 이주미, 이정식, 김현미, 웅산, 김준 등이 출연해 ‘Take Five’ ‘What a Wonderful World’ 등 익숙한 재즈곡을 열연했다.
웅산 씨는 “재즈가 국내에서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갖는 데 기여한 소중한 공간이다. 사라진다니 형언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정식 씨는 “해외 음악가들과 격의 없이 어울린 추억을 잊지 못할 것”이라고 돌아봤다.
임 사장은 “폐업이 슬픈 소식으로 회자되는 걸 원치 않는다”면서 “하나의 트렌드에 휩쓸리지 않고 여러 스타일이 공존하는 문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인이 설 무대가 있는 환경을 꿈꾼다”고 말했다.
임 사장은 줄곧 독신이다. ‘…블루문’ 하나로 충분한 삶이어서다. 그는 “스물두 살 아들과 사별하는 느낌”이라며 고개를 무대 쪽으로 돌렸다. 그의 젖은 시선이 무대 배경의 ‘ONCE IN A BLUE MOON’ 네온사인에 멎었다.
“지나 보니 참 행복한 세월을 보냈네요. 언젠가 다시 연 ‘…블루문’에서 한국 재즈 빅밴드가 ‘Fly Me to the Moon’과 ‘Blue Moon’을 연주하는 상상을 합니다. 메들리로 합쳐 ‘Fly Me to the Blue Moon’은 어떨까요. 다시 ‘…블루문’으로 날아가고픈 게 딱 지금 제 심정이거든요. 낮은 생존을 위한 시간이지만 밤은 한 사람의 라이프스타일을 결정짓는 시간입니다. 문화가 숨쉬는 당신의 밤을, 언젠가 제게 다시 맡겨주실 수 있을까요.”
임희윤 기자 imi@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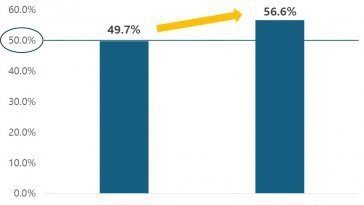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