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훠궈: 내가 사랑하는 빨강/허윤선 지음/192쪽·1만1200원·세미콜론


그는 훠궈를 맛있게 먹는 방법도 안다. 재료를 넣을 땐 두부, 감자, 무, 연근, 죽순 순으로 넣어야 한단다. 팽이버섯, 시금치, 양상추, 치커리 같은 연한 채소는 살짝 데쳐서 먹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훠궈를 찍어 먹는 소스를 잘 만드는 비법도 추천한다. 다진 파, 고수, 마늘, 땅콩가루, 태국고추, 굴 소스, 설탕 등을 고루 넣어야 한단다. 언뜻 보면 요리책인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그러나 책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저자는 새벽 퇴근 후 홀로 24시 훠궈 음식점을 찾아간다. 그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본다. 새벽에 출출한 배를 채우는 사람들은 서로를 의식한다. 그는 “무엇을 하다 온 사람들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편의점의 차가운 음식이 아닌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축복”이라고 말한다. “훠궈를 끓일 때면 조금 따스해진다”는 말엔 위로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라면도 주인공이 된다. 띵 시리즈 중 하나로 작가 윤이나가 쓴 ‘지금 물 올리러 갑니다’엔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는 삶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다. 라면은 1봉지씩 포장돼 있어 누구든 자신의 취향에 맞게 끓여 먹을 수 있다는 것. “냄비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물이 천천히 끓을 때도, 남의 집에서도, 조건이 조금 다르거나 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나를 위한 라면을 맛있게 끓일 수 있다”는 윤이나 말엔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묻어 있다. 작가 김훈이 2015년 펴낸 산문집 ‘라면을 끓이며’(문학동네)에서 “슬프다, 시장기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라고 라면에서 비극을 찾았다면, 윤이나는 라면에서 희망을 본다.
음식은 각자에 의해 다르게 해석된다. 날마다 새로운 음식들이 나오고 소개되니 소재는 무궁무진하다. 에세이의 조건을 다 지닌 셈이다. 꼭 작가만 기록하란 필요도 없다. 지금이라도 일기나 블로그에 오늘 먹은 음식과 단상을 적어보는 것도 좋겠다. 언젠가 누군가 침 흘리며 보는 ‘맛있는 책’을 엮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이호재의 띠지 풀고 책 수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e글e글
구독
-

기고
구독
-

우아한 라운지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두껍고 무거운 고전, 가볍게 읽고 싶을 때[이호재의 띠지 풀고 책 수다]](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1/04/09/106338501.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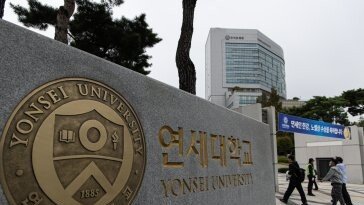
![형제애로 마련한 400억…감사 전한 튀르키예[동행]](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402416.1.thumb.jpg)
![[사설]기업파산 역대 최대 “어떻게든 올해만 살아남자는 심정”](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471129.1.thumb.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