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5년 3월 9일
플래시백
처음 개성 옷감 ‘송고직’과 양말을 들고 팔러 다닐 때는 막막했습니다. 여학교와 병원 가정집 문을 두드리면서도 부끄러운 마음이 앞섰고 입도 벙긋하지 못했죠. 남자들은 응원했지만 친구나 살림하는 부인들은 오히려 뒤돌아 비웃기도 했습니다. 그럴수록 ‘부끄러움을 없애자, 뜻한 일을 반드시 이루자’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한 처녀 포목상이 1925년 되돌아본 과거입니다. 당초 그는 장사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경성 이화학교 고등과 3학년을 마친 뒤 고향인 개성 호수돈여학교로 전학해 학업을 마친 나름 신여성이었죠. 졸업하던 해 3‧1운동이 일어나 정신없이 뛰어다녔고 그해 가을 교편을 잡은 여학교에서 천황 생일행사에 참석하지 말라고 학생들을 선동했다며 면직처분을 받아 인생행로가 멈칫했습니다.

동아일보 1925년 3월 9일자 6면에 나온 여성 사업가 이경지의 사연입니다. ‘구직하는 이를 위하여’ 문패로 7회 연재한 기사는 여학교 교사, 유치원 교사, 은행원, 포목상, 여기자, 공무원, 간호사로 일하는 여성들을 차례로 소개했습니다. 고등보통학교 이상을 나온 여성들이 진출한 직종에서 이미 자리 잡은 선배들의 생활을 전해 취업정보를 주는 기사였죠. 각 회마다 앞부분에는 경성의 주요 여학교 졸업생들의 진로도 알려주었습니다. 동덕여학교, 중앙유치사범과, 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 배화여학교, 진명여자고등보통학교, 정신여학교, 이화여학교,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순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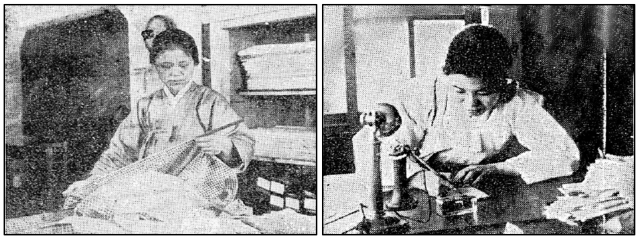

따라서 교사나 은행원 사무원 등은 1920년대 중반 일제강점기 때 여성들이 진출할 수 있는 최고 직업이었습니다. 스스로 벌어 입에 풀칠해야 하는 여성들은 어찌어찌 하다 공장에 갔습니다. 담배공장 고무공장 정미공장 제사공장 등이었죠. 1925년 1월 1일자 ‘신산한 생활과 비통한 경력담’에서 소개된 여공들은 힘겨운 장시간 노동으로 몸이 점차 망가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부장 문화의 집에 돌아가도 일이 쌓여 있었던데다 부모나 자식을 제대로 돌볼 겨를도 없었죠. 아홉 살짜리 아이까지 데려와 일을 시키는 형편이었습니다. 처녀 여공들은 몸이 고달픈 한편으로 길가는 여학생만 보면 치솟는 부러움을 감출 수 없었죠. 증조, 고조할머니들의 땀과 눈물, 의지를 딛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렀다는 점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과거 기사의 원문과 현대문은 '동아플래시100' 사이트(https://www.donga.com/news/donga100)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동아플래시100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오늘과 내일
구독
-

이주현의 경매 길라잡이
구독
-

후벼파는 한마디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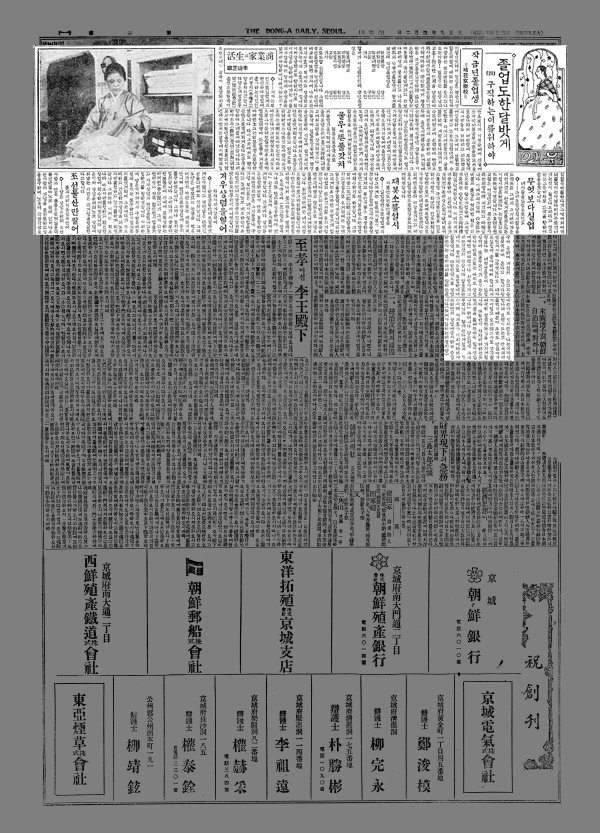
![[동아플래시100]독립운동가 싹 잡아들일 일제의 새 그물, 치안유지법](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1/07/09/107872564.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