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김숨 ‘제비심장’ 펴내
“조선소 현실 13년전보다 팍팍… 노동자 영혼의 아름다움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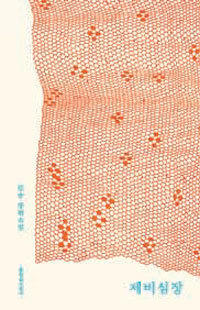
소설가 김숨이 이렇게 말하며 나지막한 한숨을 내쉬었다. 소설 ‘듣기 시간’(문학실험실), ‘한 명’(현대문학) 등에서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의 증언을, ‘떠도는 땅’(은행나무)에서 강제이주 고려인의 목소리를 담아낸 김숨이 이번에는 조선소 노동자들의 이야기 ‘제비심장’(문학과지성사)으로 돌아왔다. ‘철’(문학과지성사) 이후 13년 만에 다시 써낸 조선소 이야기다. 지난달 23일 출간한 이번 작품에서 김숨은 노동자의 급을 나누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노동 현실을 담았다. 그는 왜 다시 조선소로 돌아왔을까. 13일 그를 전화로 인터뷰했다.
“13년 전에 비해 조선소의 노동 현실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졌다고 생각해요. 원청-하청-재하청으로 이어지는 노동자의 분류는 여전히 공고하고 이제는 삶이 더 팍팍해져 사람들이 타인의 고통에 훨씬 무감각해졌거든요.”
집필에 앞서 그는 현직 조선소 재하청업체 노동자와, 노조를 조직하다 해고된 노동자를 만나 심층 인터뷰했다. 현직자와는 세 번째로 잡은 약속에서야 가까스로 마주 앉을 수 있었다. 김숨은 “매번 갑작스레 잔업이 생겼다며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못했던 노동자가 나이 예순을 넘긴 여성이라는 것을 알고 마음이 무거워졌다”고 말했다. 이런 과정들이 노동 현장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됐다고 한다. 이들과 더불어 작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만났던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모습, 작업복을 입은 채 술잔을 기울이는 인근 술집의 풍경 등이 모두 소설에 녹아들었다.
그가 이토록 당사자의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숨은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을 인터뷰하면서 어떤 일의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쓸 때는 당사자의 의사와 입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배웠다”고 했다. 소설의 극적 전개를 위해 소설가는 피해를 과장하거나 피해자가 가까스로 회복한 존엄성을 또다시 훼손할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데,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면 이런 유혹을 떨칠 수 있다는 것. ‘제비심장’이 그리 처참하게 쓰이지 않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땀에 찌든 얼굴빛, 깨진 손톱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쓰고 싶지 않았어요. 이번 소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훼손되지 않은 그들 영혼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답니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형제애로 마련한 400억…감사 전한 튀르키예[동행]](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402416.1.thumb.jpg)

댓글 0